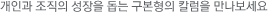

- 구본형
- 조회 수 7007
- 댓글 수 8
- 추천 수 0
언젠가 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 내게 남아 있는 날 중 가장 젊은 날, 오늘, 그것을 시작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첫 장면을 만들었다. 쉬엄쉬엄 바람이 천천히 지나 듯, 그렇게 채워가리라.
1.
그 남자가 탄 차가 육중한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들이 박았다. 그는 목과 척추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나 담가 위에 뉘어져 세찬 등불아래 보이는 그의 얼굴은 몹시도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자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의 이마에는 길게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 좍 그어 놓은 빗금처럼, 그것은 죽음의 서명처럼 이마에 그려져 있었다. 왼손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다. 긴 침묵 속에서 마음을 추스르던 그의 아내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의 손이, 그 아름다운 손이', 그녀는 고통 속에서 그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그는 겨우 마흔 일곱이었다. 그리고 이 일은 1960년 1월 4일 월요일 오후 1시 55분 상스에서 파리로 가는 7번 국도, 아름드리 플라타너스가 궁륭을 이루는 빌블르뱅 마을 어구에서 일어났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미리 사둔 기차표가 들어 있었다. 기차를 탔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친구의 자동차로 파리로 향했다. 죽음은 기어이 그를 찾아 왔던 것이다. 그의 작은 가방은 자동차가 가로수를 들이 받는 충격에 의해 창밖으로 튕겨져나와 길 옆의 밭고랑에 떨어져 있었다. 그 검은 가방 속에는 그가 죽기 전까지 열중했던 육필 원고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한 번도 다시 손질하지 않은 원고였고, 종종 마침표도 쉼표도 없이 숨가쁘게 펜을 달려 썼기 때문에 읽기도 어려웠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34년이 지나 이 원고가 출판되어 세상에 나왔다. 그 소설을 이렇게 시작한다.
'돌투성이의 길 위로 굴러가는 작은 포장마차 저 위로 크고 짙은 구름 떼들이 석양 무렵의 동쪽을 향해 밀려 가고 있었다. 사흘전에 그 구름들은 대서양 위에서 부풀어 올라 서풍을 기다렸다가 이윽고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동요하는가 싶더니 인광처럼 번뜩이는 가을 바닷 물위를 대륙 쪽으로 곧장 올라가 모로코의 물마루에서 실처럼 풀렸다가 알제리 고원 위에서 양떼들처럼 다시 모양을 가다듬더니 이제 튀니지 국경에 가까워지자 티레니아 바다 쪽으로 나가서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있었다. '
긴 문장이 골목을 휘감아 오르는 바람처럼, 봄바람 속 휘날리는 여인의 긴 머플러처럼 너울대는 듯, 속삭이는 듯 온몸을 숨가쁘게 감아 오르 듯 엄습해 왔다. 그리하여 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