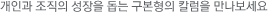

- 구본형
- 조회 수 6650
- 댓글 수 8
- 추천 수 0
배움은 지천에 깔려 있다. 산과 들에 핀 잡초처럼 무성한 것이 배움의 재료들이다. 책을 한 권 열면, 그 속에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굳이 스승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러니 누구의 제자이며, 누구의 학파이며, 누구의 진전을 이어 받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 지 모르겠다. 백년 인생에 스승은 무수할 텐데.
그러나 살다보니 그게 또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은 역시 사람 맛이 제일이다. 그 마음 속에 존경하고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 분이라면 어찌 했을까'라고 별이 되는 분이 있다. 어두운 밤하늘에 무수한 별이 있으나, 늘 마음 속 우주의 같은 곳에 떠 있는 별이 하나 있다. 그리하여 여기저기를 헤맬 때, 내가 어디에 있는 지를 보여주는 그 별이 바로 스승이다.
내 좋은 스승에 비추어 좋은 스승은 아마 이러리라 짐작해 본다.
그 스승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살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그 삶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삶을 닮아 있었다. 그 분과 그 삶이 참으로 잘 어울렸다. 스승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분이 곧 그 삶이었다.
그 스승은 최고였다. 젊은 나는 그렇게 가슴 뛰는 이야기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들어 보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 흥분하게 하고 나아가게 했다. 나는 열렬히 배우고 싶었다. 스승은 하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스스로 그 이야기가 되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려는 그 아름다운 표정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 스승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내 삶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서운했으나 스승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 남는 것도 내 일이고, 떠나는 것도 내 일이이기 때문에 권하지도 잡지도 떠밀지도 않았다. 그러나 늘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었고, 적절히 물어 주었고, 나를 믿어 주었다. 내 삶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다. 내가 힘들고 초라할 때, 나는 결코 그 축복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빛나는 별같은 지지였다.
저녁이 다 되어, 채소밭에 물을 주다 문득, 그리움으로 어린 잎에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었다. 그때 나는 물을 그리워하는 어린 채소였고, 그 분은 오래 기다린 비처럼 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인연의 아름다움이여.
젊은 나는 그렇게 가슴 뛰는 이야기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들어 보지 못했다."
그를 처음볼때 나는 그를 어떻게 불러야할지 잠시 생각했다.
선생님, 소장님, O본 형님... 애라~ 이제부터는 '사부'다.
그 후로 나는 그를 사부님이라 불렀다.
스승과 제자간의 공식적인 고리도 없지만
내 마음 속 '별'이 되는 그를 나는 혼자 그렇게 불렀다.
싸부님~~~
나는 천성이 워낙 free한 사람이다.
누구한테도 조직한테도 얽매이는 스타일이 아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드나드는
좋게말해 보헤미안 같은,
토속적으로는 반골기질의,
낭만적이고자하는 아웃사이더에게도
그리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지만
그 이름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