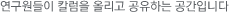
- 미나
- 조회 수 2065
- 댓글 수 11
- 추천 수 0
La Dolce Vita. 달콤한 인생. 이 말을 붙잡고 지난 열흘간 내가 마주했던 이탈리아를 떠올리니 주책 맞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일요일 아침. 처음 마주한 밀라노에서 굴러다니는 낙엽들에서 느껴졌던 외로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밀라노 두오모에서 경건하게 미사를 올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느껴졌던 편안함,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며 내려다 보였던 아씨시의 자연에서 느껴진 여유로움, 피렌체의 좁은 일방통행길들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배려심, 성곽위로 달리던 사람들이 있던 조용한 시골마을 루카에서 느껴졌던 포근함. 이런 감정들이 이탈리아 현장이 아닌 사람들과 차들로 넘쳐나 북적이고 시끄러운 홍대 거리에서 느껴지기 때문일까?
사랑, 감동, 슬픔, 외로움, 즐거움. 이런 감정들로 둘러 쌓인 내 삶은 항상 ‘달콤한 인생’이라기 보다는 ‘달콤했던 인생’ 혹은 ‘달콤할 인생’이다. 지금의 감정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꽤 불행한 일이다. 지금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 그랬지…’라고 후회하고 미련을 갖고, 아쉬워한다.
피렌체에서의 첫날 밤, 잊고 있던 내 사랑을 기억에서 끄집어냈다. 내 생애 처음으로 큰 용기를 내어 한 사람에게 고백하고 바보같이 내가 먼저 떠나 버렸던 풋사랑. 애정표현이 서툴러 큰 상처만 주고 떠나가게 만들었던 첫사랑. 계속 잊지 못하면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다. ‘괜찮아, 니 잘못이 아니야. 우린 그저 운명이 아니었을 뿐이야.’라고. 그렇게 떠나고, 떠나게 만들었던 나를 합리화했다. 그렇지만 합리화의 끝은 언제나 ‘그래도 그 때 내가 좀 더 잘 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그렇게 떠나진 않았을텐데…’라며 후회가 밀려들었다.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매어 있는 나를 발견했다. 사실 과거보다는 미래에 좀 더 매어 있었던 것 같다. 그다지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과거가 없기도 하지만, 다행히 매 순간 과거보다는 현재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삶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 꿈꾸었던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은 아니었다. 꿈꾸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였을까? 어쩌면 내가 기대하는 미래란 내 목숨이 다해 아케론의 슬픈 강가에 이르기 전까지 내 눈 앞에 펼쳐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엄습해 왔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머물러 있는 지금의 공간에서 내 삶의 의미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때마침 매 순간을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한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과거의 어떤 순간이나 미래의 공상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은 현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거야.” 그리고 그는 그날 우리가 함께 했던 술자리에서 테이블을 손으로 만지며 “현재가 즐겁지 않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지. 이 테이블을 만져보며, ‘아, 이 나무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었구나.’라던지, 방치해 두었던 나의 몸을 쓰다듬어보면서, 살아있음을 느껴본다던지, 가족들과 유쾌한 대화를 시도 해 본다던 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랬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거창한 미래의 어떤 모습만을 꿈꾸며 살다 보니, 지금의 소소한 행복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다.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행복의 세잎클로버를 짓밟는 것처럼 말이다. 남들 같았으면 이미 가야 할 방향도 어느 정도 잡고, 안정기에 접어들었거나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점인데, 또 다른 사춘기에 접어들어 반항기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언니를 항상 걱정해 주고, 사랑스러운(?)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 주는 나보다 철이 일찍 들어버린 동생들이 둘이나 있고, 매달 용돈을 드리고고, 때 되면 돌아오는 가족의 행사에 척척 봉투를 내밀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큰 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만 보면 짜증부터 내고, 대화하기를 거부하기를 일삼고, 대화를 시도할라 치면 가방 싸서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철 없는 첫째에게 “그래도 난 니가 알아서 잘 하고, 잘 살거라 믿는다.”고 말 해주는 엄마. 부부동반 모임에 아빠 없이 혼자 가도 자식들이 잘 자라준 덕분에 늘 위풍당당한 엄마가 내 곁에 있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걱정해 주고, 30군데는 원서를 써봐야 한다며 채찍질 해주는 친구도 있다. 선택의 기로에서 조언을 구하면 늘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사부가 있고, 직언과 조언,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선후배, 동기들이 곁에 있다. 몸에 안 좋은 것 다 해도 여전히 건강한 나의 장기들과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몸도 있다. 커피한잔, 술 한잔 사달라고 떼 쓰면 당장 달려와 줄 수 있는 이들도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 자주 울리지는 않지만, 쓸만한 핸드폰, 월급 대신 받은 노트북도 있다.
지난 열흘간 내가 몸담았던 이탈리아를 떠올리며 주책 맞은 눈물이 흘렀던 이유는, 아마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이제서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그 곳을 제대로 다시 느껴보고 싶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을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달콤하다. 이제 그 달콤함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만끽할 일만 남았다. La Dolce Vi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