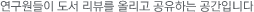
- 김귀자
- 조회 수 2916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제목만 써놓고 하릴없이 자판기만 툭툭 때려대고 있다.
몰입, 아직 글쓰기에 몰입이 안된 탓이다.
이 책은 전에도 두 번 읽어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읽는 것은 내 삶에 ‘몰입’이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사실 책 내용이 기억에 잘 남지 않은 이유도 있다. 책에 몰입이 잘 안 되서인 듯 하다.
미하이 칙센트는 시카고 대학 심리학 교수로, FLOW 라는 개념을 유명하다. Flow는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 혹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의 표현이다. 내 운명의 주인이 온전히 내가 되어 기분이 고양되고, 행복하다는 기분을 맛보는 순간이다. 칙센트 미하이는 바로 이런 느낌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의식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내가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몰입 (flow experience)은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 집중하며, 몰두한 상태이다. 신선들 장기노름에 자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던 어느 나무꾼의 이야기가 바로 ‘몰입’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몰입’이 왜 중요한 것일까? 그냥저냥 살면 안되는가?
저자는 “삶을 훌륭히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라고 주장하며, 몰입을 삶의 질과 연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가장 보람찬 경험, 몰입의 빈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몰입은 대체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높아진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무협지를 읽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 그것을 좋아할 때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미친다 혹은 미쳤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봤다는 표현이지 않을까? 곤충에 미치든, 축구에 미치든, 공부에 미치든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몰입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생각은 산만하게 흩어지고, 행동은 무질서하며, 따분함과 짜증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흐트러지고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몰입의 경험이 미국인의 15%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일상생활에서 하루 한번이라도 몰입을 해본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것이다.
몰입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내가 ‘군주론’ 책을 보고 있다면, 왜 보고 있는지 자기만의 동기와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숙제를 위한 건지, 나의 지적성장을 위한건지, 뻐기기 위한건지 등등 말이다.
둘째,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당구를 치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난다. 못하고 있다면 몰입은커녕 짜증과 좌절만 늘겠지만, 이건 여기서 열외다.
셋째,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과제수준이 너무 높으면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로 연결되기 쉽다. 반대로 과제 수준이 낮으면 느긋하거나, 권태를 느낀다. 과제와 자신의 실력이 동시에 높게 부합하면 적절한 긴장과 함께 몰입하는 경험을 맛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글쓰기’는 실력에 비해 과제수준이 높은 ‘불안, 걱정, 각성’ 상태인 듯하다. 글을 쓰려고 할 때면 알게모르게 스트레스가 만빵이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보일때는 특히 그렇다.한편으론 과제 수준이라기보다 글쓰기에 대한 나의 기대수준이 높아서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나의 기대를 낮춰 내 실력에 맞는 글을 쓰거나, 나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되겠지. 나는 후자를 택하고 싶다.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다고 고대 사상가들은 주장했다. 학교를 뜻하는 ‘school'이 여가를 뜻하는 ’scholea'에서 왔다고 하니 여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곧 학문하는 길이라는 말도 이해가 간다. (사실 잘 가진 않는다. 그럼 여가 시간에 공부를 해야하는 건가? ㅡ.ㅡ)
에디슨이 자신은 평생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실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달걀대신 시계를 끊는 물에 넣고도 알지 못했던 뉴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몰입은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달성케 해주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좋은 몰입 뿐 아니라 나쁜 몰입도 있다. 공부대신 게임에 몰두하느라 밤새는 아이들(게이머가 된다면 이것또한 별개 문제다.), 폭탄제조를 즐기는 행위처럼 파괴적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처럼 몰입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몰입의 즐거움이 주는 목표를 찾아나서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세상의 무질서를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부적인 것에 휩쓸려 가고 있다고 느낄 때, 이 책을 한번씩 살펴보면 좋다. 책 자체에 몰입은 쉽지 않으나 뒤적거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얻는 구절이 있을 것이다.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 경주용 차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목적 없이 달린다면 기름값만 아까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 한 구석에서 느끼는 나의 모습은 외계인이다. 나는 지구를 잠시 방문하러 왔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라는 종에 유독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빌린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무한성이 있다. 나에게는 이것들이 너무나 친숙한 관념이다. 경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 나름의 수행이요 정진이니 어쩌겠는가.”
-어느 괴짜같은 사회학자 왈-
IP *.145.121.57
몰입, 아직 글쓰기에 몰입이 안된 탓이다.
이 책은 전에도 두 번 읽어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읽는 것은 내 삶에 ‘몰입’이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사실 책 내용이 기억에 잘 남지 않은 이유도 있다. 책에 몰입이 잘 안 되서인 듯 하다.
미하이 칙센트는 시카고 대학 심리학 교수로, FLOW 라는 개념을 유명하다. Flow는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 혹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의 표현이다. 내 운명의 주인이 온전히 내가 되어 기분이 고양되고, 행복하다는 기분을 맛보는 순간이다. 칙센트 미하이는 바로 이런 느낌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의식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내가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몰입 (flow experience)은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 집중하며, 몰두한 상태이다. 신선들 장기노름에 자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던 어느 나무꾼의 이야기가 바로 ‘몰입’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몰입’이 왜 중요한 것일까? 그냥저냥 살면 안되는가?
저자는 “삶을 훌륭히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라고 주장하며, 몰입을 삶의 질과 연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가장 보람찬 경험, 몰입의 빈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몰입은 대체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높아진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무협지를 읽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 그것을 좋아할 때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미친다 혹은 미쳤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봤다는 표현이지 않을까? 곤충에 미치든, 축구에 미치든, 공부에 미치든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몰입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생각은 산만하게 흩어지고, 행동은 무질서하며, 따분함과 짜증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흐트러지고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몰입의 경험이 미국인의 15%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일상생활에서 하루 한번이라도 몰입을 해본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것이다.
몰입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내가 ‘군주론’ 책을 보고 있다면, 왜 보고 있는지 자기만의 동기와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숙제를 위한 건지, 나의 지적성장을 위한건지, 뻐기기 위한건지 등등 말이다.
둘째,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당구를 치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난다. 못하고 있다면 몰입은커녕 짜증과 좌절만 늘겠지만, 이건 여기서 열외다.
셋째,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과제수준이 너무 높으면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로 연결되기 쉽다. 반대로 과제 수준이 낮으면 느긋하거나, 권태를 느낀다. 과제와 자신의 실력이 동시에 높게 부합하면 적절한 긴장과 함께 몰입하는 경험을 맛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글쓰기’는 실력에 비해 과제수준이 높은 ‘불안, 걱정, 각성’ 상태인 듯하다. 글을 쓰려고 할 때면 알게모르게 스트레스가 만빵이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보일때는 특히 그렇다.한편으론 과제 수준이라기보다 글쓰기에 대한 나의 기대수준이 높아서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나의 기대를 낮춰 내 실력에 맞는 글을 쓰거나, 나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되겠지. 나는 후자를 택하고 싶다.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다고 고대 사상가들은 주장했다. 학교를 뜻하는 ‘school'이 여가를 뜻하는 ’scholea'에서 왔다고 하니 여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곧 학문하는 길이라는 말도 이해가 간다. (사실 잘 가진 않는다. 그럼 여가 시간에 공부를 해야하는 건가? ㅡ.ㅡ)
에디슨이 자신은 평생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실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달걀대신 시계를 끊는 물에 넣고도 알지 못했던 뉴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몰입은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달성케 해주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좋은 몰입 뿐 아니라 나쁜 몰입도 있다. 공부대신 게임에 몰두하느라 밤새는 아이들(게이머가 된다면 이것또한 별개 문제다.), 폭탄제조를 즐기는 행위처럼 파괴적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처럼 몰입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몰입의 즐거움이 주는 목표를 찾아나서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세상의 무질서를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부적인 것에 휩쓸려 가고 있다고 느낄 때, 이 책을 한번씩 살펴보면 좋다. 책 자체에 몰입은 쉽지 않으나 뒤적거리는 것만으로도 뭔가 얻는 구절이 있을 것이다.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 경주용 차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목적 없이 달린다면 기름값만 아까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 한 구석에서 느끼는 나의 모습은 외계인이다. 나는 지구를 잠시 방문하러 왔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라는 종에 유독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빌린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무한성이 있다. 나에게는 이것들이 너무나 친숙한 관념이다. 경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내 나름의 수행이요 정진이니 어쩌겠는가.”
-어느 괴짜같은 사회학자 왈-
VR Left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32 | 니체, 천 개의 눈 천 개의 길 [1] | 박소정 | 2006.06.21 | 2335 |
| 531 | 군주론 - 마키아벨리에 대한 변호 | 이종승 | 2006.06.20 | 2348 |
| 530 |
니체의 재발견 | 꿈꾸는간디 | 2006.06.20 | 2329 |
| 529 | 15: 마키아벨리 '군주론' | 김귀자 | 2006.06.19 | 2333 |
| 528 | 군주론(君主論, II Principe) | 조윤택 | 2006.06.19 | 2311 |
| 527 | 완당평전 (20060619) | 이미경 | 2006.06.19 | 2650 |
| 526 | 니체, 천개의 눈 천개의 길 [2] [1] | 정경빈 | 2006.06.18 | 2040 |
| 525 | 천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 | 이종승 | 2006.06.18 | 2463 |
| 524 | 바티칸의 금서(禁書) -군주론 | 정재엽 | 2006.06.17 | 3254 |
| 523 | 차라투스트라는 말한다 [1] | 한명석 | 2006.06.17 | 2134 |
| 522 | 마키아벨리, 군주론(살짝 수정) | 박소정 | 2006.06.15 | 3059 |
| 521 | 니체라는 거대한 구조물 | 한명석 | 2006.06.14 | 2318 |
| 520 | 14: 천 개의...니체 | 김귀자 | 2006.06.13 | 2342 |
| 519 | 군주론 [2] | 정경빈 | 2006.06.13 | 2222 |
| 518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 꿈꾸는간디 | 2006.06.12 | 2672 |
| » | 몰입의 즐거움 | 김귀자 | 2006.06.09 | 2916 |
| 516 |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조셉 캠벨) // 내용정리중 (~252) | 다뎀뵤_미영 | 2006.06.07 | 2334 |
| 515 |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 꿈꾸는간디 | 2006.06.07 | 2088 |
| 514 | 뒤늦게 올리는... 쉽게 읽는 백범일지(20060609) [1] | 이미경 | 2006.06.06 | 2657 |
| 513 | 화인열전(畵人列傳)을 읽고 | 조윤택 | 2006.06.06 | 22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