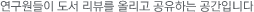
- 박경숙
- 조회 수 2556
- 댓글 수 0
- 추천 수 0
북리뷰35 - 주역강의:을유문화사-20101122
1. 저자에 대하여
초아 서대원(草阿 徐大願)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법학도이던 그는 24세 때 평생 역술인으로 살아온 부친의 뜻에 따라 역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때부터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일 뿐이던 『주역』을 읽기 시작했다. 그 후 30년 넘게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마음으로 새기며 『주역』의 큰 뜻을 맛보았고, 현실에 지친 보통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조언하고 상담해 왔다.
오랜 공부 끝에 그는 『주역』이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주역』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의 지침을 전해 준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으로 『주역』이 전하는 삶의 큰 원리와 작은 기술들을 환히 밝혀 그 참뜻과 감동적인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 한다. 또한 본문 한 페이지를 읽기에도 버거워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주역』의 참맛과 귀중한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역리학회 부산시 지부와 부산역리학회에서 학술위원장, 명리학, 복서학 강사를 지냈으며, 현재 여러 기업체 등에서 『주역』을 주제로 활발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cho-a.com 을 운영하고 있다.
2. 내 마음에 무찔러 드는 글귀
추천의 글 - 日山 구본형
『주역』과 만나는 가장 쉬운 길
[P. 9] 마흔 살 10년은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반전이 만들어진 시기였다. 나는 내 길을 찾은 것 같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네가 살고 싶은 바로 그 삶이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나는 춤추듯 이 길을 아주 멀리 끝까지 가고 싶다.
[P. 10] 내가 저자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이 책을 골라 넣은 까닭은 한가지 밖에 없다. 사지 않을 수 없는 책이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나는 이 책의 49번째 괘를 펴들었다. 그것은 ‘혁革’괘였다.
[P. 10] 그 부분을 뒤적이다. ‘혁언삼취유부革言三就有孚’라는 글귀에 눈이 머물렀다. 이 책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두었다.
“혁언은 세 번 성취되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다. 혁언은 혁명과 개혁에 대한 논의와 공약이다. 이런 혁언은 세 번 거듭 성취되어야 비로소 백성과 민중의 신망이 쌓인다는 말이니, 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성취해야 하는 것이 혁명이요 개혁이라는 의미다.”
[P. 11] 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뼛속까지 겪어 본 사람이다. 혁명과 개혁은 성과 없이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념으로 시작하지만 성과 없이는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혁명과 개혁이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를 무수히 반복하는 것이 바로 혁명과 개혁이다. 이 어려운 책이 종종 무릎을 치게 하는 이유는 어쩌다 알아들은 몇마디가 이렇게 사무치기 때문이다.
[P. 11] 학문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감추지 않을때 비로소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다른 주역의 역해서가 주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보았다. 이보다 더 쉬울수 없다.
서문 - 삶을 위한 새로운 『주역』 읽기 - 草阿 서대원
나는 왜『주역』해설을 썼는가?
[P. 13] 그저 30년 넘게 『주역』원서를 머리맡에 두고 책장이 해지도록 읽고 또 읽었을뿐이다. 그런데 내가 이처럼 미련할 정도로 『주역』에 내달린 첫 번째 이유는 오로지 점占을 잘 치기 위해서였다.
[P. 14]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하는 말이 착하다.”
공자의 수제자인 증자께서 남기신 말씀이다.
[P. 15] 나는 30년 넘는 내 나름의 『주역』 공부 끝에, 결국 『주역』이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라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또한 그처럼 한 생각을 돌이키자, 이제까지 오리무중이기만 하던 『주역』의 구절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읽히는 감동도 맛보았다. 이 책은 그런 나만의 감동을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에서 맨 처음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P. 16-19] 내가 읽은 『주역』은 어떤 책인가?
첫째 『주역』은 난해한 책이다
둘째, 『주역』의 주석서나 해설서들은 『주역』 자체보다 더 난해한 책들이다.
셋째,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 아니다.
[P. 17] 『주역』은 보편 타당한 진리를 말한 책이지 장래의 개인적 길흉화복을 예견한 책이 아니다.
넷째, 『주역』은 단순한 유교 경전이 아니다.
다섯째, 『주역』은 심오한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한 처세의 책이다.
이 책은 무엇이 다른가?
[P. 20] 첫째, 필자는 한글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역』해설서를 집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한자들마다 음과 훈을 달았고, 본문에서도 한극 번역문에 해당되는 원문의 글자를 거듭 세세하게 밝혀두었다.
둘째, 필자가 풀이하고 해설한 것은 『주역』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 책은 8괘며 64괘 따위의 괘卦와 관련된 점술 해설서가 아니라는 점만을 거듭 밝혀 둔다.
셋째, 각 장별로 최대한 논리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P. 21] 넷째, 『주역』을 점술서가 아니라 일종의 철학서, 처세서로 풀이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현실에서 부딪치면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설하고자 노력했다. 『주역』은 점술서가 아니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 조언하고 있는 책임이 분명하다. 하늘의 이치와 땅의 섭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주역』의 진술 대부분은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 『주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주역』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1) 『주역』이란?
[P. 23] ‘주역周易’이란 글자 그대로 주나라(BC 111년경~256년경) 시대의 역이란 말이다.
[P. 23] 이때의 역은 ‘변한다’는 뜻인데, 천지만물이 변화하는 궁극의 원리를 밝히고, 사람도 그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기술된 책이 바로 역서易書이며, 그 중 하나가 『주역』인 것이다.
2) 『주역』은 언제 누가 지었나?
[P. 24] 중국 전설상의 제왕 복희씨가 황하에 출현한 용마의 등에 있는 무늬를 보고 계시를 얻어 8괘를 만들고, 이것을 발전시켜 64괘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복희씨가 8괘를 만들고 신농씨가 64괘로 나눈 것에 주나라 문왕이 괘사를 붙였으며, 그 아들인 주공이 효사를 지어 완성했다고도 한다.
[P. 24-25]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은 중국 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고 정리한 성과물을 집대성한 책이며, 역사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 온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주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P. 25-26] 첫째, 모두 6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m
둘째, 64개의 장마다 건 곤 둔 몽 등의 제목이 붙어 있으며, 이를 64가지 괘의 명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64개의 장은 대개 7행의 본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행은 흔히 괘사卦辭 라 하고, 나머지 6행은 여섯 개의 효爻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이라고 이해하여 효사爻辭라 한다.
넷째, 본문 외에 소위 십익이란 것이 붙어있다. 십익은 본문 7행에 대한 일종의 각주이자 풀이에 해당하며, 단전 상하 상전 상하 계사전 상하, 문언전 설괘전, 서괘전 잡괘전의 열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2. 『주역』의 체계와 변모의 과정
[P. 31]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주역』에 괘상이 붙은 것은, 어떤 선인이 <주역>의 본문을 공부하면서 8괘를 붙여 나름의 지혜를 얻고자 새로운 시도를 했고, 후에 이것이 굳어져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P. 32] 『주역』은 기본적으로 세상 만물의 변화 원리와 그 변화하는 모습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인간 생활의 처세 방법과 지혜를 가르친 책이지 점을 치도록 만들어진 점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P. 33] 『주역』은 세상만물의 변화 원리를 밝힌 책이다. 멈춘 것 같으면서도 변화하고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일정한 원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네 인생이다. 『주역』은 이처럼 인간사에 얽힌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밝히고 그 원리를 천명함으로써, 세상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인생을 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친 철학서이자 처세서이다.
[P. 33-34] 『주역』은 그 전체로도 훌륭한 우주론적 철학을 담고 있지만, 64장 각각은 인상사의 다양한 측면을 간명하고도 예리하게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밝혀 놓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했던 것이다.
1. 건乾- 자연의 섭리를 묻는 이에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P. 35]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시간과 선택된 공간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은 갖가지로 달라진다. 주역의 건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공의 3대 요건(시간, 공간, 사람)을 인생의 각 단계에 빗대어 총체적으로 설명한다.
[P. 36] 건은 크게 천지창조에서 멸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작게는 한 생명의 잉태, 성장, 활동, 죽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에 관계되어 있다. 그 때를 잘 아고 움직여야 한다. 우선 너무 일찍 뜻을 펼쳐서는 안 된다. 설령 때를 만나 실제로 일을 도모하게 되더라도 인맥을 얻어야 리도를 얻을 수 있다. 무릇 군자는 일을 힘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저녁이 되면 다시 반성하고 걱정하는 법이니 비록 그 일이 험하여도 허물은 없다.
[P. 37] 건(乾)은 원(元)과 형(亨)과 리(利)와 정(貞)의 모든 시절과 통한다.
건은 크게는 천지창조에서 멸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작게는 한 생명의 잉태, 성장, 활동, 죽음의 단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시간에 관계되어 있다.
[P. 37] 원(元)은 혼돈의 시절이다.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의 혼돈스러운 시절이며, 무극(無極)의 시절이라고 하다.
[P. 37-38] 형(亨)은 카오스 다음에 오는 창조의 시기이다. ................인간이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고,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P. 38] 리(利)는 왕성한 활동과 결실의 시절이다. 배움을 마치고 때를 얻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壯年)이 여기에 해당된다.
[P. 38] 정(貞)은 소멸의 시기이다. 우주의 수명을 다해 스러지는 최후의 순간, 곧 종말의 시기에 해당된다.
<건(乾)>에서 사용한 네 종류의 용 비유 >
|
시간의 이름 |
특성 | ||||
|
『주역』 |
식물 |
동물(인간) |
우주 |
용 | |
|
원(元) |
근(根) |
포태양(胞胎養) |
무극(無極) |
잠용(潛龍) |
혼돈(混沌) |
|
형(亨) |
묘(苗) |
생욕대(生慾帶) |
태극(太極) |
현룡(見龍) |
창조(創造) |
|
리(利) |
화(花) |
관왕쇠(冠旺衰) |
황극(皇極) |
비룡(飛龍) |
완성(完成) |
|
정(貞) |
실(實) |
병사장(病死葬) |
멸극(滅極) |
항룡(亢龍) |
소멸(消滅) |
[P. 39] 『주역』은 단순한 점술서라기보다는 삶의 기본 원칙과 큰 방향을 안내하는 철학서이자 실생활의 지침서라고 보아야 온당할 것이다. 거기에는 삶을 위한 철학이 담겨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정신적 물질적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도 함께 들어 있다.
[P. 40] 潛龍 勿用 (잠용 물용)
잠룡潛龍은 쓰지 말라는 말이니, 곧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뜻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P. 40]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더 배우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P. 40] 見龍在田 利見大人(현룡재전 리견대인)
현룡見龍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 곧 밖으로 나아가 밭에서 할 정도가 되더라도, 인맥을 얻어야 리도(利道)를 얻을 수 있다.
[P. 40-41] 현룡見龍은 드디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 용이니, 사람으로 따진다면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할 준비를 마치는 단계에 해당된다.
[P. 41] 용이 밖으로 드러난다 함은 마침내 사람이 사회로 나아갈 때를 얻었다는 뜻이다. 또한 이렇게 때를 만났다는 것은 곧 하늘이 그 기회를 허락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P. 41] 『주역』은 시간과 공간의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요소가 더 있으니, 바로 사람(大人)이다. 리(利)의 도(道)를 얻으려면 훌륭한 인사(人士)가 모여 서로 조력하고 희생해야 한다.
[P. 41] 여기에서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중요성과 조화를 강조한 『주역』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시간과 공간 못지 않게, 결국은 사람의 힘이 강조된 문맥을 통해 인본주의 사상 역시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현룡재전 리견대인> 상징과 비유
|
구절 |
내용 |
삼재 |
의미 |
|
현룡(見龍) |
시간(時間) |
천(天) |
신과의 교감 |
|
재전(在田) |
공간(空間) |
지(地) |
환경을 얻음 |
|
대인(大人) |
인본(人本) |
인(人) |
인맥을 만남 |
[P. 43] 비룡飛龍은 하늘을 나는 용이니 최고의 기회를 만나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시기이자, 그런 때를 만난 사람의 상징이다.
[P. 44] 항룡亢龍은 후회함이 있다는 말이니, 시간이 지나 때를 넘긴 늙은 용에게는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무릇 사람은 물러나 때를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은 구절이다.
[P. 47] 건을 통해 『주역』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시간과 공간의 관계, 그리고 그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세상사는 이치의 근본을 밝게 보여주고 있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과 공간, 나이가 신과의 교감까지를 개괄적으로 언급한 건의 가르침이야말로 『주역』의 핵심사상이라고 믿는다.
2. 곤坤 - 인간의 길을 묻는 이에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원리, 상생
[P. 55] 세상의 만물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상생의 도리이다.
[P. 55] 곤은 이처럼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복잡다단한 삶을 폭넓게 조만하면서, 공생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생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P. 56]坤 元亨利牝馬之貞 君子 有攸往 先迷後得 主利 西南
得朋 東北喪朋安貞 吉
履霜 堅氷至
直方大 不習无不利
含章可貞或從王事 无成有終
括囊 无咎无譽
黃裳 元吉
龍戰于野其血玄黃
利永貞
[P. 56] 땅 위의 존재인 인간은 모두 원, 형, 리의 시간을 거치며 살다가, 마침내 죽음에 순종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군자는 나아가 뜻을 펼치매 처음에는 혼미하여도 뒤에는 뜻을 얻는 법이니, 성공의 주인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상생의 도리이다.
상생하면 재화와 덕망을 얻을 것이며 상극하면 이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그 끝을 인식하여 몸과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
겉으로는 쉽고 약해 보여도 내면은 어렵고 강한 것이 현실의 세계다.
삶은 가르치거나 훈련받지 아니해도 자연히 아는 것이니,
인간이 만들고 가르친 학문에만 의지하는 학자라면
혹 정치를 한다 해도 이룸은 없고 끝만 있게 된다.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 역시 허물은 없으나 명예를 얻지 못한다.
만민과 자연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박애하는 삶,
그런 삶이라야 근원적으로 길하다.
만약 상생의 원리를 어긴 종교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양쪽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된다.
하지만 문명의 번영을 누리는 현재의 세상은그 끝까지 오래 남았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현재의 환경과 삶을 길이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한다.
[P. 57] 君子 有攸往 先迷後得 主利
군자는 나아가 뜻을 펼치매 처음에는 혼미하여도 뒤에는 뜻을 얻으니, 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다. 누구나 뜻을 펼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P. 59] 『주역』의 본문에 등장하는 서남이나 동북이라는 단언ㄴ 단순한 방위의 표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각각 상생과 상극을 의미하는 암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P. 66-67]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곧 곤의 세계에서는 서로 상생하면 재물과 덕을 얻을 것이요, 상극하면 덕망도 잃고 실재(失財)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그 끝을 헤아려 욕심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P. 67] 『주역』은 우선 자신감을 갖고, 자연에 귀의하라는 말로 그 가르침을 시작한다. 인간에게는 배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원초적인 힘,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타고난 힘이 내제되어 있다는 것이 『주역』의 설명이다. 그 힘을 믿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다.
[P. 69] 문제는 그런 종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주역』의 태도는 단호하다. 인간과 세상, 물질과 부로 표현되는 리(利)의 세계에서 종말의 시기인 정(貞)이 세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길게, 매우 길게(永) 남아 있다는 것이다.
3. 둔屯 - 사랑에 빠진 젊은이에게 - 사랑할 때와 기다릴 때
[P. 71] 사랑은 세상만물의 본성이며, 모든 사랑은 아름답다.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사랑을 할 줄 알고, 훼방을 놓아도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자만이 맛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 사랑을 예측하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결실까지도 아름다운 사랑을 가꿀 수 있다.
[P. 72] 屯 元亨利貞勿用 有攸往 利建候
磐桓 利居貞利建候
屯如 邅如乘馬班如 匪寇 婚媾 女子 貞 不字 十年乃字
卽鹿无虞 惟入于林中君子 幾 不如舍 往 吝
乘馬班如 求婚媾往 吉 无不利
屯其膏 小貞吉大貞凶
乘馬班如 泣血漣如
[P. 72] 둔(屯)의 애욕은 원, 형, 리, 정의 모든 시간대를 거친다.
욕정을 억누르고 미래를 위한 큰 뜻을 세워 매진함이 옳다.
둔(屯)의 시절, 곧 사춘기에는 누구나 목표 없이 방황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비록 큰 욕망이 엄습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하고,
먼 장래를 위하여 뜻을 크게 세워야 한다.
여리고 순진한 사람이 온갖 멋을 부리며 첫사랑을 하지만
대개 연인은 떠나고 오랫동안 실연의 아픔에 시달리게 된다.
숲 속에서 사슴을 발견하나 몰이꾼이 없으니,
욕심을 내어 잡으려고 나아가면 얻지는 못하고 고생만 한다.
연애를 발전시켜 최종적으로는 결혼에 이르러야 길하고 어려움이 없다.
젊은 나이에 욕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인을 만나는 일은,
그것이 짧은 시간에 끝나면 괜찮지만 길어지면 흉하다.
철부지의 욕망으로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고 때를 놓친다면
뒤에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P. 78] 둔(屯)은 사랑의 장이다. 남녀간의 사랑과 욕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P. 78] 우선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둔(屯)’이라는 글자 자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한자의 둔(屯)은 재지를 타나내는 일(一)과 새싹을 나타내는 철로 구성된 글자다. 따라서, 둔은 어린아이, 사춘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P. 79] 사랑을 알되 지나치지 말라. 『주역』의 가르침이다.
4. 몽蒙 -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참교육의 도
[P. 86] 蒙 亨
匪我求童蒙童蒙求我
初筮 告 再三瀆 瀆
則不告
利貞
發蒙 利用刑人用탈桎梏 以往 吝
包蒙 吉 納婦吉 子 克家
勿用取女 見金夫不有躬 无攸利
困蒙 吝
童蒙 吉
擊蒙 不利爲寇利禦寇
[P. 86] 몽蒙은 형亨의 시절에 통한다. 참 진리는 인간이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진리가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생명의 순수성이다.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 가르침을 얻게 될 것이나,
순수성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세상에서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타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지위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공부로는 자신이 억눌림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뿐,
궁극적인 삶의 고난과 허무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덕을 익혀 너그럽고 포옹력 있는 생활의 도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면,
가사를 부인에게 맡겨도 길하고, 자식 또한 집안을 잘 이끌어 간다.
그러한 공부의 과정에서는 경계할 것들이 많으니
우선 여인에게 기대지 말라. 여인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쉽게 몸과 마음을 주니 이롭지 못하다.
또한 어렵고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면 고난만 많아진다.
그러므로 자연의 섭리에 의한 공부만이 길하다.
한편,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도 있으니,
이는 공공의 안녕과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격몽의 교육이다.
[P. 87] 蒙 亨 (몽 형)
몽은 어린 아이, 어리석음, 교육 등의 뜻을 가진 글자다.
[P. 87] 이러한 교육은 형(亨)의 시절에 주로 이루어진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원형리정(元亨利貞)가운데 형이 시기, 곧 청소년기와 젊은이의 시절임을 말한 것이다. 교육은 이때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리(利)와 정(貞)의 시절에 쓰이게 된다.
[P. 87]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비아구동몽 동몽구아)
직역하면 ‘내(我)가 동몽童蒙 을 구求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童蒙 이 나我를 구求한다는 말이다. 이때의 ’동몽(童蒙)‘은 『주역』에서 최고의 경지로 생각하는 교육의 형태이자, 순수한 도의 경지, 최고의 인격을 상징한다. 얄팍한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P. 87] 동몽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아무나 도달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하늘이 돕고 자연이 도와야 가능한 경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해야된다고 말한 것이다. 무릇 참 진리는 인간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가르쳐 주는 법이다.
[P. 88] 初筮 告 再三瀆 瀆則不告(초서 고 재삼 독 독즉불고)
[P. 88] 교육의 최고 경지가 단순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단 말일까?
[P. 88] 인간이라는 자연의 한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순수성, 자연성, 생명성을 최고 경지에 이르는 필요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과의 합일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말이다. 이런 순수성을 잃어버린 세계가 이 구절에 나오는 독의 세계이다.
[P. 88] 그 순수성이 유지될 때는 자연이 필요한 진리를 일러준다.
[P. 88] 이처럼 『주역』은 자연과 합일하여 대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함을 최상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자연과 합일함이 몽(蒙)의 도(道)이다. 이를 한마디로 동몽이라 하여 교육의 형태 중 최고의 경지로 설명하였다.
[P. 92] 童蒙 吉(동몽 길)
[P. 92] 동몽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의 공부다. 목적도 없고 실용성도 염두에 두지 않은 공부, 오직 자연의 이치에 대한 궁금증으로만 가득 차 순수한 의문의 세계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공부가 동몽이다.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함이야말로 자연과 동화되고 신과 교감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예수의 말과 같은 맥락이다.
[P. 93] 이러한 동몽의 완성은 서책이나 인위적인 학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도리가 스스로 나에게 닥쳐와야 이루어지는 그런 배움이다.
[P. 95] 자연의 진리에 몸을 맡겨, 진리 자체가 나를 찾아오도록 몸과 마음을 열어두는 공부를 해야만 진정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5. 수需-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어떻게 때를 기다릴 것인가
[P. 104] 需 有孚 光亨貞吉 利涉大川
需于郊 利用恒无咎
需于沙 小有言終吉
需于泥 致寇至
需于血 出自穴
需于酒食 貞吉
入于血 有不速之客三人來 敬之 終吉
[P. 104] 수(需,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수적이다. 성공에 대한 굳센 믿음과 함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밝은 빛이 마침내 길을 여는 것과 같으니,
그 끝이 반드시 길하다. 이로써 대업이 시작된다.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로 때를 기다린다면, 이룸이 늦고 허물도 없다.
청빈하고 곧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시작 단계에서 작은 부딪침은 있으나 끝에는 길하다.
부정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은 도둑을 키움과 같다.
지나치게 혈기가 왕성한 채로 기다린다면, 거점을 지킬 수 없다.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자기의 일을 즐기면서 여유있게 기다린다면,
끝에는 길하여 성공한다.
기다림이 마침내 무르익으면 천시와 환경과 귀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공경하고 그의 경륜에 따르면 반드시 성공한다.
[P. 105] 『주역』은 이처럼 기다림에는 반드시 믿음과 확신,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시작한다.
[P. 105] 리섭대천(利涉大川)은 큰 내를 건넘이 이롭다는 말이나 모험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주역』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P. 105] 최종적인 대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기다림 외에도 마지막의 실천적인 모험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P. 110] 어떤 일을 제대로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일에 적당한 때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때가 맞지 않으면 일이 성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110)
[P. 110-111] 이로써 『주역』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대나 기다림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P. 111] 『주역』은 미래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현재의 경제적인 활동을 능률적으로 행하고, 본인과 가족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다림을 최상의 기다림으로 설 하였다. 청렴하고 곧게 살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을 둘째로, 제도권 밖에 머무르면서 속으로는 정치 참여를 갈구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중적인 태도의 기다림을 그 아래에 두었다.
[P. 111] 기다림의 결과 내가 지금 발 디딘 환경 위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나를 도울 인물도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주역』은 가르친다.
[P. 111]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원칙 세 가지를 간추려 보자. 첫째는 믿음이다. 둘째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다. 셋째는 마침내 도래한 타이밍을 정확히 판단하여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추어야 진정으로 기다림의 미학을 깨닫고, 때를 만나 큰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9. 소축小畜 - 작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통한 작은 행복 만들기의 지혜
[P. 152] 小畜 亨 密雲不雨自我西郊
復自道 何其咎吉
牽復 吉
與탈輻 夫妻反目
有孚 血去惕出无咎
有孚 攣如富以其隣
旣雨旣處 尙德載 婦 貞 厲 月幾望 君子 征 凶
[P. 152] 작은 성공이나 행복도 일찍부터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구름이 빽빽하나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듯이,
쉬워 보이는 작은 행복도 얻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집 바깥에서 기다리고만 있기 때문이다.
원만한 가정과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무슨 허물이 있으랴. 길하다.
설령 타인에게 이끌리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 길하다.
소축小畜의 작은 행복으로 가는 수레바퀴가 이탈하면, 부부가 서로 반목하게 된다.
믿음으로 생사의 두려움을 없애야 허물이 없다.
바로 곁의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부를 창출하고,
믿음으로 결속하는 것도 소축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때가 왔을 때 일을 이루고 성공해야 좋다. 욕심으로 능력 밖의 일을 하니 부인이 걱정하고,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덤벼드니 흉하다.
11. 태泰-태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어려운 때를 대비하고 노력하라
[P. 173] 泰 小往 大來吉 亨
拔茅茹 以其彙征 吉
包荒用빙河不遐遺朋亡 得尙于中行
无平不파 无往不復艱貞 无咎 勿恤 其孚 于食有福
翩翩 不富以其隣 不戒以孚
帝乙歸妹 以祉元吉
城復于隍 勿用師自邑告命 貞 吝
[P. 173] 태평한 삶은, 기본적으로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길함은 젊은 시절부터의 노력으로 인해 성취되는 것이다.
비록 현재는 쓸모가 적은 것이라도 저축하여 어려울 때를 대비하면 길하다.
어렵고 험난한 일을 극복하여 큰 공을 세우고 입지가 달라지더라도,
공을 내세우지 않고 옛 친구를 우정으로 대하면 가상한 일이 생긴다.
평지만 계속되는 인생이 없듯이 비탈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다.
오기만 하는 인생이 없듯이 가기만 하는 인생도 없다.
어려움이 오래 계속되더라도 허물이 없다면 근심하지 말라.
믿음과 자신감만 있다면 먹고사는 일에는 복이 있게 마련이다.
훨훨 나는 새처럼 부유하지 않아도, 이웃과 더불어 서로 경계하지 않고 믿으니 이 또한 태평의 한 형태다.
누이를 왕에게 시집 보냄은 태泰의 복이요, 길함의 근본이다.
평소에 위기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적의 침범으로 성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고향에 찾아가 엎드려 도움을 청하지만 끝내 고생만 하게 된다.
[P. 173] 태(泰)는 태평함이며 개인적인 안녕과 영달, 국가적인 평화와 번영을 모두 포함한다.
[P. 179] 태평한 삶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태(泰)는 이처럼 누구나 바라는 태평한 삶이 어떻게 이룩될 수 있는지를 해설한 장이다. 태평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심신이 건강하고 힘차야 한다. 이는 개인의 내적인 일이며 천부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다음은 작은 것을 투자하여 큰 것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외적이며 노력과 관계가 깊다. 그리고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태(泰)를 얻을 수 있다.
[P. 179-180] (태평한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주역』은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들을 꼽고 있다.
첫째,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의리와 신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셋째,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한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권세와 권력이 없으면 태평은 유지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12. 부否-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막힌 운을 뚫는 두 가지 방법
[P.184] 거부와 막힘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막힘의 때에는
군자일수록 더 분리하다. 막히는 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혁과 갱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막힘의 시절에 미래를 대비하는 행위는 끝까지 힘차야 길하다.
소인은 변화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지키기만 하니 길하지만,
대인은 막힘의 운을 강하게 거역하니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처럼 변화와 발전을 포기하고 현재에 안주함은 부끄러운 일이다.
운이 막히는 때에도 절도 있고 흠 없이 살면 결국 천명을 얻어 벗어날 수 있다.
대인은 금방 망할 것 같은 때에도 누에가 실을 뽑듯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을 풀어 나가는 법이니, 막힘의 운도 마침내 멈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막힘이 운을 뒤집고자 노력하니, 처음엔 어려워도
나중에는 성공하여 웃게 된다.
[P. 189] 『주역』은 우선 이런 거부와 막힘의 운세가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요, 한두 번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만큼 막힘의 운세는 질기고 강한 것이다.
이런 거부와 막힘의 운세에 맞닥뜨리면 군자도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또 막힌 운을 뚫고자 발버둥치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운이 뚫리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다.
[P. 190] 그 대신 『주역』은 대인들이 취하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부단히 모색하는 자세를 권장한다. 힘없는 누에가 기신기신 끝없이 실을 자아내듯이 어렵더라도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절도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문제를 풀어 가라는 것이다.
15. 겸謙-겸양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강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
[P. 210] 겸(謙,겸양)의 도리는 어려서부터 익혀야 하고
군자도 마지막에야 이를 완성한다.
겸겸(謙謙)의 도를 이룬 군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를 이겨내니 길하다.
명겸(鳴謙)의 도를 행하면 결국 길하다.
로겸(勞謙)의 도를 이룬 군자는 끝내는 뜻을 이루니 길하다.
휘겸(撝謙)의 도를 행하면 불리함이 없다.
겸은 무조건의 용서가 아니다.
대의를 그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징벌을 해야 불리함이 없다.
명겸(鳴謙)의 도는 군자를 일으켜 나라를 정벌하기도 한다.
[P. 214] 겸손은 무지나 나태, 혹은 안일에서 비롯되는 무조건적인 수용과는 다르다. 『주역』에 따르면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고, 정의가 아닌 것을 용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P. 215] 진정한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 『주역』은 겸손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타고난 근기(根氣)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겸손의 경지가 다르고, 현실 정치의 와중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겸손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종교인의 겸손과 정치인의 겸손이 다르고, 도를 닦는 사람과 학문을 하는 사람의 겸손이 다르며, 초월을 꿈꾸는 사람의 겸손과 생활인의 겸손이 다르다는 것이다.
16. 예豫-큰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계획, 어떻게 세우고 지켜야 하나
[P. 219] 介于石 不終日 貞吉(개우석 부종일 정길)
개우석(介于石)은 돌(于石)에 새겨(介) 맹서(盟誓)한다는 뜻이다. 『주역』은 이런 맹서를 매일(日,종일) 멈추지(終) 않으면(不), 그 끝(貞)이 길하다고 했다. 계획과 더불어 그 실천의지를 다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P. 223] 모든 큰일에는 반드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에, 『주역』은 우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신의 능력과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상하고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P. 223]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세운 계획이라면 굳이 남들에게 떠벌릴 일이 아니라, 혼자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계획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돌에 글을 새기듯 매일매일 결심을 새로이 하고 한결같이 매진해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를 ‘개우석介于石의 맹서盟誓’라고 표현했다.
20. 관觀-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정관을 얻는 지혜
[P. 251] 觀 盥而不薦 有孚顒若(관 관이불천 유부옹약)
[P. 251] 관(觀)의 도(道)는 관이불천(盥而不薦)과 유부옹약(有孚顒若)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관이불천(盥而不薦)의 관(盥)은 몸을 씻는다는 말이니 목욕재계를 통한 몸과 마음의 정화다. 불천(不薦)은 그렇게 씻어낸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니, 부동(不動)의 자세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여 어떤 외풍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관이불천이다.
유부(有孚)는 믿음과 신뢰이며, 옹약(顒若)은 공경과 겸손이다.
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부동심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관의 도를 주재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P. 255] ‘관’은 보는 지혜에 대한 장이다. '본다'는 말에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뜻도 있지만 읽는다, 알아챈다, 헤아린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 그러므로
상대와 나를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관(觀)의 도(道)요, 정관(正觀)의 지혜다.
[P 255] 이 도를 깨우치면 또한 세상만물의 근원과 만사의 움직이는 원리를 모두 알 수 있게 되니, 굳이 점을 치지 않아도 미래를 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 256]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야할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의 지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타개하고 전진할 수 있는 삶의 지혜, 바로 그런 지혜를 전해 주고자 『주역』은 저술된 것이다.
[P. 257] 이와 같이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상황을 아는 세 가지 눈만 갖추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아갈 바를 찾을 수 있고,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이다,
23. 박剝-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꽉 막힌 시절을 견디는 지혜
[P. 275]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절은 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으며
빚은 눈덩이 굴러가듯 불어만 간다.
도망갈 방법이라고는 목숨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이 박剝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운運은 돌고 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빛이 비치게 마련이다.
[P. 281] 세상은 음양의 조화로 인하여 평화롭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기운이 넘치거나 모자라면 혼란스럽고 추해진다. 박剝은 이런 음양의 조화가 깨어지고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겹친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장이다.
박剝은 음기가 극도로 강해지고 양기가 거의 소멸된 시기다.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상도 못했던 재해가 몰려온다.
26. 大畜대축-야망을 키우는 사람들에-큰 성공의 조건
[P. 301] 大畜 利貞不家食 吉 利涉大川(대축 리정 불가식 길 리섭대천)
대축은 리(利)와 정(貞)의 시절에 통한다고 했다. 이는 대축이 이른 나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년 이후의 원숙한 나이가 되어서나 가능한 일임을 말한 것이다.
대축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불가식(不家食)은 가족을 먹이지 못한다는 말이니,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다.
둘째, 섭대천(涉大川)의 모험이다. 큰 강물을 건넌다는 말이니, 남들이 두려워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감행하는 결단력과 용기, 추진력을 뜻한다. 모든 위대한 정치인과 탁월한 사업가들은 한결같이 이런 모험정신과 추진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P 305] 대축大畜은 크게 키운다는 말이다.
[P 305] 키우는 과정에서 작은 이익이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좀 더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대축이다.
[P 306] 대축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을 크고 넓게 본다. 따라서 소소한일을 놓치기 쉼고 세세한일의 진행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큰일이라도 작은 부분에서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단속해야 한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익을 따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대축을 이룰 수 없다. 대축을 이루려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순수하고, 위선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
[P 306] 대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 등의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키우고, 사람의 사귐을 신중히 하여 순수하고 지혜가 밝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해야 한다. 대축(大畜)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기운이 함께 임해야 하는데, 이를 대운(大運)이라 한다.
27. 이灑-도를 묻는 사람들에게- 속세에서 갈고 닦아라
[P. 307]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가족을 천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부양하며,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도인이다.
[P. 315] 『주역』에서 말하는 도인의 모습은 문자 그대로 ‘길을 아는 사람’이다. 천지와 만물의 운행 원리를 궁구하여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자신을 관찰하여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결정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주역』이 말하는 도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생활에 충실하면서도 타인과 자연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인간이 바로 『주역』의 도인이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알고 만물의 운행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28. 대과大過 - 동량을 찾는 사람들에게 - 과함을 이기는 지혜
[P. 319] 대들보가 아무리 단단하고 좋아도 지붕을 너무 무겁게 얹으면 견디지 못하고 휘어진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잘 생겼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기면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람만 상한다.
[P. 326]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다. 어떤 물건이든 용도와 격에 맞게 써야지, 욕심을 과하게 부려 엉뚱한 데 사용하면 일 전체를 어그러뜨린다. 하물며 사람은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자기 그릇의 크기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많이만 담고자 하거나, 격에 맞지 않게 너무 큰일을 도모하면 일을 이루기는커녕 심신만 상하고 만다. 사람을 쓸 때에도 그릇과 품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소인에게 대사를 맡기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대과大過는 이러한 오류의 양상들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하여 설명한 장이다.
[P. 326] 대과大過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양과 절약이다, 몸을 낮추고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과를 피할 수 있다.
[P. 326] 겉은 거칠어도 속이 바른 나무는 동량으로 쓰이지만, 보기에 좋아도 굽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마찬가지로 외모가 번듯하고 실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품성이 바르지 못하면 큰일을 함께 도모할 수 없으며, 실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마음 쓰는 것이 곧고 진실한 사람은 더불어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29. 감坎-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법
[P 328] 설혹 감에 빠지더라도, 헤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면, 행함에 가상함이 있다. 구덩이 속에서 다시 구덩이에 빠지니 흉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을 구하면 적은 덕을 얻을 수 있다.
[P 329]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탈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역』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라고 말한다. 이런 믿음과 희망이 있어야 구체적인 탈출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믿음과 희망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탈출을 모색할 수도 없으니,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자포자기일 뿐이다, 곤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믿음과 희망이 중요하다.
[P 334] 먼저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역』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을 공평무사하게 대하면 된다. 사실 인생에서 만나는 구덩이는 다른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다.
[P 334] 또한 사람들에게 미리 인심을 얻어 둔다면 나중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틀림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 335]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선악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천 길 구덩이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가 있다.
32. 항恒-변화가 두려운 어른들에게-변화와 불변의 변증법
[P. 358] 변치 않는 항(恒)의 생활은 형(亨)이 시절에는 허물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리(利)와 정(貞)의 시절이 오면 누구나 현실에 참여해야 유리하다.
지나치게 오래 항(恒)에 머물면 흉하고 유리하지 않다.
항(恒)에는 후회가 없다.
항(恒)에 덕(德)을 아예 부정하면 수치를 겪을 수 있고 결국 궁색해진다.
항(恒)에 집착하니 밭에 사냥감이 없다.
마지막까지 항(恒)의 덕을 지키는 자세는 부인에게는 길하나
지아비나 아들에게는 흉하다.
항(恒)의 운세에 세상을 뒤흔들고자 욕심을 내니 흉하다.
[P. 359] 항(恒)은 불변이며 물러섬이다. 절대적인 불변이나 물러섬은 아니고, 우주와 자연이 선택한 정도의 불변이고 물러섬이다. 발전과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자연이 선택한 수준의 경지와 불변을 지향하는 것이 항(恒)이다. 자연과 닮으려는 태도며 무위無爲의 삶을 존중한다.
[P. 359] 변함없이 한결 같은 삶을 유지하는 항(恒)의 태도는, 세상을 등진 은인의 거사들에게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평생 이런 태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이다.
[P. 363] 하지만 자연이 변화와 인간 문명의 변화는 다른 것이다. 자연은 순환과 조화, 반복을 변화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자연이다. 그런 면에서 자연의 변화는 변(變)이나 동(動)이 아니라 화(化)이며 정(靜)에 가깝다.
『주역』은 이렇게 자연도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변치 않는 요소를 일러 항(恒)이라고 한다.
자연은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항(恒)을 사랑한다.
[P. 363]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 자연이 변화와 자신이 변화를 일치시킨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라는 가르침이다.
[P. 364] 인간은 그렇게 살수 없는 존재다. 항(恒)보다는 오히려 변(變)이나 동(動)을 추구해야 문명이 발전하고 개인의 행복도 증진된다. 지극히 세속적인 얘기다, 열심히 일하고 개혁을 지속해야 그나마 더 나은 내일이 열린다고 강조한다.
36. 명이明夷-때를 얻지 못한 현자들에게-되는 일이 없을 때의 처세술
[P. 394]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요소란 무엇인가? 하늘의 허락(天時)과 땅의 보살핌(地運) 그리고 인덕(人德)이다.
[P. 396]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현재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현자라면 무리없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P. 397] 자신이 명이(明夷)의 세계에 있음을 아는 기자와 정반대의 사람이 불명(不明)이고 회(晦)다. 명이지자(明夷之者)는 지혜라도 갖추었지만 불명지자는 때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불명이고 회다. 캄캄한 어둠속에 갇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아갈 길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세상에 처음(初) 나설 때에는 그 기세가 하늘로 날아오를 듯하다. 하지만 명이의 세계에서는 이런 기상이 결코 오래 갈수 없으니 자중하고 근신해야 한다. 하지만 불명지자는 자중하고 근신하지 않는다. 어두운 사람이기때문이고 그래서 더 어둡다. 그러니 결국 나중에는 땅속으로 추락하고 만다.
[P. 398] 『주역』에서는 이처럼 때를 얻지 못한 현자, 지혜를 갖추었으나 이를 세상에 나아가 펼치지 못하는 군자를 명이지자(明夷之者)라 하였다. 진지자가 천시를 얻어 자신의 경륜과 사상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군자라면, 명이지자는 경륜과 지혜는 갖추었으나 운과 시를 얻지 못해 뜻을 펴지 못하는 현자인 셈이다.
[P. 398] 명이지자(明夷之者)가 그나마 심신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운이 명이임을 깨닫고 세상을 떠나 조용히 은거하는 게 상책이다. 자신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명이의 기가 사라지기를 기다려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
39. 건蹇-다리가 꺾인 사람들에게-고난을 극복하는 상생의 지혜
[P. 422]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건(蹇)의 세계에서는 상생하면 이롭고
상극하면 불리하다. 대인을 만나야 이롭고 마지막까지 길하다.
건(蹇)의 운이 지나면 명예가 온다.
왕과 신하가 모든 건(蹇)의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건(蹇)의 운이 지나도 안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올 수 있다.
건(蹇)의 운이 지나도 다시 연이어 건(蹇)의 운이 올 수 있다.
큰 어려움이 닥치니 친구가 와서 도와준다.
어려움이 지나가면 큰 인물이 나타나니 길하고,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P. 425] 건은 다리를 절뚝거려 잘 걷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상이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날이 저물고 다리까지 다친 격이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거칠다, 능력도 부족하고 운도 따르지 않아 몹시 어렵게 살아가는 시절을 의미한다.
[P. 425] 건(蹇)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생(相生)의 도리를 깨우쳐야 한다.
둘째는 경륜 있는 대인(大人)을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미 건의 시기를 겪어 그 내막을 소상히 알고 있는 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려움을 조금은 쉽게 이겨낼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사람이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가짐만이 건(蹇)의 악운을 물리칠 힘을 제공한다.
[P. 436] 건의 고난을 잘 견뎌내면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 우정을 다질 수도 있다. 그리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한 번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이후의 어떠한 역경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
40. 해解- 잘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 운이 풀리기 시작할 때의 처세술
[P. 432] 건(蹇)의 어려움이 지나고 찾아오는 새로운 기운이 바로 해의 운이다. 해방의 기운이요 새로운 시작이다.
해(解)의 운이 시작되면 혼탁함이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이때에는 모두가 상생의 도리를 첫째로 삼아야 한다. 둘째로 모두가 일치단결해야 희망을 실현할 수 있으며, 셋째로 사리사욕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상승의 물결을 탈 수 있다.
[P. 432] 해의 운이 왔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때를 놓치면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도 성사시키지 못한다. 정확한 시기를 읽어 추진하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새겨야 한다.
과거의 어려움은 미래를 개척하는 나침반이다. 지난날의 어려움을 잊는다면, 행운이 찾아와 약간의 부와 명성을 얻게 되더라도 이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 부유해졌다면 과거를 기억해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면 지난날이 외로움을 기억해 사람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46. 升승-승승장구하려는 청년들에게-성장과 발전의 씨앗
[P. 484] 승(升,성장)은 원(元)과 형(亨)의 시절에 이루어지니,
대인을 만나 사용해야 걱정이 없고, 밝는 길로 나아가야 길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함은 길하다.
검소하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면 허물이 없다.
감상과 허무에 빠지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왕이 기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니 길하니 허물이 없다.
계단을 오르듯이 차곡차곡 오르니 끝까지 길하다.
지혜 없이 오르면 리(利)에서 정(貞)의 시절에 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P. 485]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을 만나(見大人) 그 활용하는(用) 것이다. 이는 물론 젊은 날에 위대한 스승을 만나 지도와 편달을 받아야 성장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야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고 했다.
[P. 488-489] 첫째,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둘째, 만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방향으로 인격을 닦아야 한다.
셋째, 올바른 세계관을 바탕으로 밝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허무주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계단을 밟듯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
여섯째, 험준하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는 왕처럼 모든 것을 정성스럽고도 당당하게 해야 한다.
47. 곤困-곤란한 지경에 빠진 이웃들에게-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
[P. 499]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남이 탓을 하거나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탈출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 대인(大人)이고, 이런 사람만이 곤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48. 정井-민심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좋은 우물의 조건
[P. 501] 우물의 물은 퍼낸 만큼만 새로 고인다,
퍼내지 않으면 물은 고여 썩어 버린다.
물이 귀하다고 해서
우물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막는다면
우물은 영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P. 506] 마을을 세우려는 자는 마땅히 인민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우물을 먼저 파야 하고, 세상에 나가 뜻을 펼치고자 하는 군자는 마땅히 백성들의 메마른 정신을 해갈 시켜줄 정신의 찬 샘물을 먼저 예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P. 511] 우물이 소중하다고 쓰지 않으면 우물은 오히려 더러워져 쓸 수 없게 되고 만다. 우물의 물은 퍼내지 않으면 썩기 때문이요, 퍼내면 퍼낸 만큼 새 물이 고이기 때문이다. 군자의 마음 또한 이와 같으니, 스스로 갈무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되, 만인을 향한 홍익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더 많이 베풀어라, 더 많은 덕이 쌓일 것이다.
49. 혁革-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변화와 혁명의 바른 길
[P. 514] 혁革은 구악舊惡의 때가 이미 지나서, 새로운 믿음이 생길 때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후회가 없다.
황소가죽으로 묶듯이 단단히 하라.
때가 이미 지난 것이라야 개혁할 수 있으니, 나아가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급히 나아가니 흉하고 끝이 위험하다. 개혁에 관한 말이 세 번 성취된 후에야
믿음이 생긴다.
후회가 없고 믿음이 있다면 혁명도 길하다.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하니 미래를 점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
혁명의 뒤끝에는 군자도 표변하고 소인도 안면을 바꾼다.
나아가면 흉하고 끝까지 머물러 가만히 있으면 길하다.
[P. 516] 鞏用黃牛之革(공용황우지혁)
황소의 가죽(黃牛之革)을 써서(用) 단단히 묶는다(鞏)는 말이니, 이는 혁(革)을 이끄는 마음가짐에 대한 표현이다. 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황소의 단단한 가죽으로 묶듯이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떠한 장애나 저항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P. 519] 혁을 위해서는 우선 청산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구악과 폐습, 과거의 잘못된 광행과 인습이 바로 그것이다. 누가 이런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 때를 이미 넘긴 사람들, 이미 시기가 지난 구태의연한 제도와 시스템들이다. 모든 것에는 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이 주역의 기본 생각인데, 이 때를 이미 지나 버렸으니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P. 520] 개혁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선 개혁의 주체 스스로 개혁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57. 손巽-겸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겸손의 재조명
[P. 589] 겸(謙)은 윗사람의 미덕이고
손(巽)은 아랫사람의 미덕이다.
겸은 다스리는 자의 마음가짐이고
손은 다스려지는 자의 행동지침이다. 어떻게 겸손할 것인가?
[P. 596] 지나치게만 겸손하지 않으면 손은 좋은 것이라고 했고,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손의 도를 닦으면 진퇴의도를 알게 되어 이롭다고 했고, 어려서부터 이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P. 596]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처럼, 다르되 같이 움직이는 두 가지 겸손의 태도가 겸과 손이다,
60. 절 節-매듭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한시대를 마감하는 지혜
[P. 613] 하늘이라도 찌를 듯,
울울창창 곧게 뻗은 대숲을 보았는가
댓잎을 스치는 시퍼런 바람소리를 들어 보았는가
대나무가 한 치의 흐트럼도 없이 곧은 건
그 마디가 단단하기 때문이다,
제때 마디를 맺지 못하면 인생이 굽니다,
[P. 615] 節 亨 苦節 不可貞(절형 고절 불가정)
마디(節)를 맞을 때는 힘차야(亨) 한다. 고통으로 마디를 맺으니(苦節) 가히 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다.
[P. 618-619] 대나무가 마디를 맺음은 왜인가? 당연히 속도 빈 주제에 하루 하루 쑥쑥 크기만 하다가는 그 휘어짐과 몸통의 갈라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나무는 무리하게 자라기전에 빈 몸통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전에 마디를 맺는다. 쑥쑥 자라는 대나무가 가진 절제의 미덕이 아닐 수 없다. 마디를 맺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한다면 대나무는 당연히 그렇게 크게 자랄 수도 없고, 약한 바람에도 곧 꺽이거나 휘고 말 것이다.
61. 중부中孚-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믿음의 정체
[P. 622] 중부는 복어를 다루듯 해야 길하고
큰 내를 건너는 이로움이 있어야 끝까지 이롭다.
헤아려 염려하니 길하고 다른 것이 있으니 편치 않다.
어미 학이 그늘에서 부르니 그 새끼가 회답하다.
내게 좋은 잔이 있으니 내 너와 더불어 나누리라.
적을 얻으매 혹 두드리고 혹 그치고 혹 울고 혹 노래한다,
달이 거의 참이 마필이 사라지니 허물은 없다.
믿음에 있어 맺으니 허물이 없다.
날지 못하는 한음(翰音)이 하늘에 오르니 끝이 흉하다.
[P. 627] 『주역』은 어떤 면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다. 『주역』에 따르자면 인간사 모든 일이 믿음에서 비롯되고 믿음으로 이룩되며 믿음이 있어야 좋은 끝을 맺을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일이 성취되리라는 확신, 인간 상호간의 신뢰에 대한 얘기가 장마다 연이어 강조되는 책이 바로 『주역』이다.
[P. 627] 중부(中孚)는 이런 믿음과 신뢰, 미더움과 확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르고 있는 장이다. 믿음이란 무어이고, 어떻게 해야 신뢰가 쌓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을 그냥 부라고 하지 않고 굳이 중부(中孚)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중용(中庸)의 도(道)에 입각한 믿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중용의 도에 입각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믿음, 삿된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 다른 제3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다. 서로 헤아려 근심하고 걱정하되 그 결과에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고, 어미 새가 그 세끼를 보듬는 지극함과 정성으로 상대를 믿어 주는 것이 중부(中孚)이다.
[P. 628] 이런 믿음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나의 것을 먼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서로의 것을 계산 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P. 628]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조차 믿어주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P. 628] 믿음은 또한 복어 다루듯 신중하게 다루어야 지켜질 수 있다고 하였다.........복어를 다룰 때의 신중함으로 믿음을 다루라는 얘기다.
[P. 628] 『주역』은 가능한 믿음과 불가능한 믿음을 구분하라고 조언한다.
[P. 628] 무작정 믿고 따르라는 선동가는 조심해야 한다. 세상은 믿음만 갖고 헤쳐나갈 수 있는 단순한 세계가 아닌 것이다.
63. 기제 旣濟-이미 가진 사람들에게- 물을 건넌 자의 여유
[P. 638] 기제는 젊음의 운이니 마지막에는 이로움이 작아진다.
처음은 길하지만 끝은 어지럽다.
그 수레를 끌다 그 꼬리를 적시나 허물은 없다
부인이 그 가리개를 잃어도 쫒지 말라. 이레면 얻는다.
고종이 귀방을 치리니 3년이면 그것들을 이긴다.
소인은 쓰지 마라
비단옷에 헤진 헝겊으로 기운 흔적이 있고, 종일 경계한다.
동린이 소를 잡음이 서린의 간소한 제사가
실로 그 복을 받음만 같지 못하다.
그 머리를 적시니 위태롭다.
[P. 639] 자신이 물려받은 환경을 지키려는 행동이 시대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끝이 작아지고 어지러워진다고 했다.
[P. 645] 기제자도 그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하여 시대와 자연의 흐름을 놓친다면 재앙을 면키 어렵다.
[P. 646] 기제의 운은 무력이나 돈만으로 얻을 수 없는 귀한 명운이다, 그러나 순조롭게 이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P. 646] 기제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시에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삼가 조심하고 경계할 일이다.
64. 미제未濟-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큰 내를 건너는 모험
[P. 648] 미제(未濟)의 운은 젊은 기운에 통한다. 작은 여우가 거의 마른 강을 건너다
그 꼬리를 적시니 유리함이 없다.
그 꼬리를 적시니 궁색하다.
그 수레를 끄니 결국 길하다.
미제는 결국 흉하며, 큰 내를 건넘이 이롭다.
마지막까지 길하여 후회가 없어진다. 우레를 써서 귀방을 치니 3년이다.
대국에서 상이 있다.
마지막까지 길하여 후회가 없다. 군자의 빛남이니 믿음이 있어 길하다.
술을 마심에 믿음이 있으면 허물이 없으나
그 머리를 적시면 믿음이 이에 잃어진다.
[P. 649] 미제자(未濟者)의 삶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기운이 젊고 힘차야 한다.
또한 미제자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P. 649] 미제자(未濟者)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뿐이다. 바로 더 큰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젊음의 그 생동하는 기운을 회복해야 한다.
[P. 651] 미제자(未濟者)의 경우 당연히 임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임금을 수행하는 장졸이 되어 전쟁을 치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귀방을 치는 전쟁은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서는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전쟁이다, 이때에는 우레와 같이 강하고 힘찬 용기로 적을 응징하여 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며, 이로서 미제에서 기제로 건저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는 미제의 세계를 벗어나는 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만인을 위한 큰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함을 강조한 구절이다.
[P. 654] 『주역』은 미제자는 기제자와 달리 큰 강을 건너는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 모험과 도전이 없는 미제(未濟)의 삶은 그 끝이 보장받을 수 없고, 수레를 거룻배에 묶어 매고 강을 건너는 모험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미제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는 미제자들이 그런 모함과 노력조차 저부하다면 대체 무슨수로 강을 건널 것이며, 무슨 수로 기제의 삶을 자랄 것인가?
3. 내가 저자라면
초아 서대원 선생님의 주역강의는 사부님의 추천에서 말하듯 무척 쉽게 풀이한 책이었다. 기존의 주역해설서가 흔히 풀이하는 64괘를 중심의 건위천, 곤위지, 수뢰둔, 수화기제, 화수미제의 이름으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추천사를 쓰신 사부님은 49번째 혁에 이끌렸다고 하셨는데, 나는 마지막인 미제의 해설에 제일 먼저 손이 갔다. 초아 선생님은 미제를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로 ‘큰내를 건너는 모험’이라는 제목을 붙여두고 있었다. 보통 주역 해설서가 ‘화수미제(火水未濟)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다시 시작하라’ 등의 설명으로 이 장을 이루어 가는데 이 책에서는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쉬운 충고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있었다. 이해가 쉬웠다. 아마 초아 선생님 자신이 직접 사람들의 운명을 상담할 때 쓰는 방식을 그대로 글로 쓰신 듯 느껴졌다.
초아 선생님은 역술가로 30년간 주역을 읽으며 그 하나 하나의 괘를다 직접 점술을 원하는 손님에게 쓸 수 있을 단계까지 풀어두고 있었는데 아마 이 책은 그가 손님들에게 직접 상담하고 충고한 말들을 글로 그대로 쓴 게 아닌가 생각 들었다. 그런 이유인지 이 책에는 중복되는 말이 너무 많아 중언 부언하는 듯한 문장이 보였다. 좀 줄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간혹 주역과 세상풍경이라는 제목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지루할 수 있는 본문의 흐름에서 머리를 식힐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자신이 점을 친 이야기 등은 책에서 좀 제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나의 경우 주역을 오래전에 접했으나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동전으로 점을 치며 놀던 그때 빨간 표지의 태극주역을 뜻도 모른 채 펼치고 또 펼친 기억이 난다. 지천태, 산지박 그런 용어는 익숙하긴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고, 또 주역의 뜻을 이해할 마음도 기회도 없어 완전히 잊고 있던 책이었는데, 다시 초아 선생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주역이 참 재미있는 책이라고 느껴져, 다시 처음부터 주역공부를 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주역을 접할 수 있게 해준 초아선생님의 쉬운 해설에 감사드린다. 많은 주역 책을 보았지만 주역 공부를 위한 입문서로서 이만한 책은 없을 듯하다. 조금 아쉬운 것은 64괘의 설명이 나온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주역서들이 6개의 효에 대해 양음설명을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과감히 제외하였는데 그 점이 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으나, 주역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 다른 책을 함께 봐야 하는 불편함을 주었다. 6효의 음양이 만나 각 괘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설명해두어도 좋았을 뻔 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612 |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 프리초프 카프라> [1] | 김연주 | 2010.11.29 | 8089 |
| 2611 |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_발췌 | 맑은 김인건 | 2010.11.29 | 2545 |
| 2610 | [북리뷰]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1] [1] | 이선형 | 2010.11.28 | 2292 |
| 2609 |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저자 구성 | 맑은 김인건 | 2010.11.28 | 2830 |
| 2608 | [북리뷰 36]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2] | 신진철 | 2010.11.28 | 2310 |
| 2607 | 북리뷰 36.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_프리초프 카프라(범양사) | 박상현 | 2010.11.28 | 2538 |
| 2606 | 북리뷰 60 :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 앤서니 라빈스 | 범해 좌경숙 | 2010.11.22 | 3611 |
| 2605 | [리뷰] 맹자,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길 | 최우성 | 2010.11.22 | 3123 |
| 2604 | 35.<행복한 논어읽기> 양병무 [3] | 박미옥 | 2010.11.22 | 3087 |
| 2603 | [북리뷰 35] 노자의 도덕경 [1] | 신진철 | 2010.11.22 | 3193 |
| 2602 | 북리뷰 35.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그린비) [4] | 박상현 | 2010.11.22 | 2678 |
| 2601 | 도덕경- 노자/현암사/오강남 | 이은주 | 2010.11.22 | 4054 |
| 2600 | [북리뷰] 맹자 | 이선형 | 2010.11.22 | 3226 |
| » | 북리뷰35-<주역강의:서대원> | 박경숙 | 2010.11.22 | 2556 |
| 2598 | 주역강의_발췌 | 맑은 김인건 | 2010.11.22 | 2574 |
| 2597 | 주역강의_저자, 구성 | 맑은 김인건 | 2010.11.22 | 3855 |
| 2596 | 주역강의 - 서대원 지음 / 을유문화사 [2] | 연주 | 2010.11.21 | 3497 |
| 2595 | 북리뷰 59 : 프레임 -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 범해 좌경숙 | 2010.11.18 | 3225 |
| 2594 | 북리뷰 34. 강의, 나의 동양고전독법_신영복(돌베개) [1] | 박상현 | 2010.11.16 | 2253 |
| 2593 | 34. <강의> 신영복 [3] | 박미옥 | 2010.11.16 | 2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