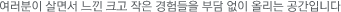
- 선비 언
- 조회 수 1832
- 댓글 수 3
- 추천 수 0
어둠 속의 대화_Dialogue in the dark
어둠의 첫 인상은 아주 무서웠다. 나 자신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어둠뿐... 텅 빈 공간을 메우는 어둠만이 있다.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끝도 없는 밤.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태양을 기다리며, 나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새카만 어둠.
짙은 불안감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진다.
나는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 벽을 따라 걷는다. 불안한 발소리와 바닥을 확인하려는 케인이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린다. 얼마쯤 걸은 것일까… 아주 오랫동안 걸은 것 같은데…그러나 암흑 속에서는 시계바늘 조차 보이지 않는다. 다시 눈을 감는다.
#
걸으면 걸을수록 공기가 맑다. 나뭇잎이 만져지고 흙이며 자갈 따위가 밟힌다. 새소리가 들린다. 청량한 공기다.
내가…
몽골에 돌아 온 건가…
칠흑 같은 암흑 속이지만, 몽골 생각을 하니 찜찜하니 긴장되어 있던 기분이 완전히 풀려버린다.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던 시각이 차단되자, 다른 감각들이 모두 저마다 한마디씩 던진다. 나의 코, 나의 귀, 나의 손, 나의 혀가, 속까지 깜깜해진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검은색 바탕에 갑자기 너른 평야가 떠오른다.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다. 온몸을 휘감던 바람의 감촉이 살아난다. 발 밑에서 억센 풀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고 저 멀리에 낮은 산들이 보인다. 낮고 넓게 펼쳐져 있던 하늘까지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재현된다. 어둠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어둠에 점점 익숙해진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으로 어둠을 칠하고 있다. 예술가가 된다. 검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몽골을 떠올린다. 머리 속 몽골에서 해가 진다. 금새 밤이 된다. 세나 언니 침낭 위에 몸을 누이고 올려다본 밤하늘이 펼쳐진다. 은하수가 푸르다.
#1. 제가 왜 거기 있었냐면요..
지난 수요일, 나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설치 전시 ‘Dialogue in the dark_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회를 다녀왔다. 빛을 완전히 차단한 방에 공원, 시장, 도시, 칵테일 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코스가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았지만, 함께 했던 가이드와 바텐더들은 모두 시각장애인들이다.
빛이 가득한 흰 도화지보다 아무 것도 없는 암흑이 상상력을 펼치기에 훨씬 적합한 바탕이 되어준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 속에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나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무리 지어 들어갔던 어둠 속에서 내가 보았던 그 어떤 밤하늘 보다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하늘을 보았고, 정보석을 닮은 바텐더와 음료수를 한잔 하면서 담소를 즐겼다.
#2. 어둠과의 대화_dialogue with the dark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차있었다. 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잠깐이었지만 빛이 없는 암흑이 남긴 인상은 짧고 강렬했다. 무서워. 답답해. 커다란 상자 안에 갇혀있다는 느낌이었다.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여길 왜 따라온다고 했지? 시각장애를 체험해 보는 게 왜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돌아나갈까? 그러나 어둠은 사람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동시에 사람을 침묵의 늪 속에 가라앉혀버린다. 나는 갑자기 내 입술이 급격하게 무거워졌다는 것을 느낀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니, 놀랐던 마음도 조금 침착해지는 것 같다. 어둠을 살핀다. 아니, 어둠이라는 녀석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를 ‘느낀다’. 나를 안고 있는 그를 느껴본다. 어둠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쉿’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잔상을 남기고 사라진다.
‘귀 기울여봐. 그리고 그려보렴.’
‘네 앞에 무엇이 있지?’
손을 앞으로 내뻗는다. 허공이 짚이는가 싶더니 자전거가 있다.
그는 쉬지 않고 질문을 한다. 내 대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넌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가 듣거나 말거나 하나하나 침착하게 대답한다. 내 옆에는 지금 윤이 언니가 있어. 난 지금 마실 걸 한잔 사러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가게로 가고 있는 거야.
실재로 나는 그렇게 했다. 어둠 속에서 마실 것을 주문하고 포도 소다를 한 모금 넘기면서, 나는 의기양양하게 그를 향해 승리의 미소 지었다. 봐, 내가 못할 줄 알았지? 안 보인다고 포기할 줄 알았지? 보이고 안 보이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난 설령 네가 방해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잘 해내고 있단 말이야.어둠이 대꾸했다.
‘아까 집에 가고 싶다고 징징댔던 게 누구더라? 윤이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를 놀리고 있다. 생각보다 짓궂은 녀석이다. 살짝 토라진 체 해본다. 쳇, 잘했다고 칭찬은 못해줄망정, 놀리기나 하고, 너 보기보다 속 좁은 녀석이구나?
‘짧은 만남이었지만, 선물을 줄게. 눈 감고 있지?’ 다시 들은 척도 안 한다. 하여간 자기 맘대로다. 그에게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문득 내가 어둠이라는 존재와 꽤 친해지고 싶어한다는 걸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수만큼 존재하는 법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연…….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모두 달라.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별만큼 많이 떠있지.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
조용히 듣고 있는다. 그는 말을 잇는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려는 것들로 가득 차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곤 해.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자신 안에서 피어나게 하려면, 자신을 이런 어둠 속으로 숨길 수 있어야 되. 빛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너무 화려해. 사람들은 빛에 정신을 빼앗기지. 그래서 정작 자신의 마음의 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빛과 암흑의 경계, 즉 이 전시회의 마지막 문 앞에서 그는 나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작별인사를 건넸다.
‘나를 만났던 이 경험을 영원히 기억해 달라고 하진 않을 거야. 다만, 잊지는 말아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네 안에 있다는 걸.’
소리 내서 웃었다. 그래, 원래 내가 외면보다 내면에 자신 있는 사람이긴 하지. 우리는 유쾌하게 악수를 했다. 빛으로 돌아가는 차원의 문이 열렸다. 마주잡은 손을 놓고 문을 향해 한 발 들여놓다가 등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물론 어둠에게는 눈이 없지만, 아직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또 보자! 아마 자주 널 찾을 거야. 난 꿈을 쫓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 않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
어둠은 착한 녀석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댓글
3 건
댓글 닫기
댓글 보기
써니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해야 겠지. 그러나 난 좋은 걸.
참, 그리고 맞아. 부지깽이님께서는 그런 감각, 느낌들을 재빨리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에 덜 들어도 느낌을 살려놓고, 다시 조정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
언의 글을 보니 잠시 제껴둔 산행에서의 체험이 생각나네. 아름다운 놈 용규님께서 실험 도구로 가지고 온 거울이었어. 하늘을 비추니 하늘만 보고 걷는 거라 할 수 있지. 마치 물 속을 헤엄치는 것 같기도 하고, 호수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 예전에 "물 위를 걷는 여자" 란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탈과 위태로움이었다면 어제의 체험은 전혀 달랐지.
자유로움과 한 마리 물고기가 되어 마치 산호초(나무가지 등) 등을 피해 걷는/헤엄치는 느낌이 들었지.
아, 내가 하늘이 바다가 되고 나무가 산호초가 되어 거꾸로 산행을 한 체험/ 물 위를 걷는 듯한 체험도 언의 체험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뒤집어 하늘을 걸으며 세상을 한마리 물고기처럼 헤엄치며, 다름과 변화를 경험한 체험도 삶의 이면이었다는 생각이야. 언의 체험의 경우처럼 상황의 반전에 대한 경이로움과 약간의 두려움도 결국에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 극복해야 할 착한 녀석의 이었던 것 같다. 시각 장애우에 대한 체험으로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한정된 시각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경우에 이입해 더 나은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다는 것도 소중한 일이 될 거야. 그러면서 삶의 지평을 넓혀가게 될 테니까.
참, 그리고 맞아. 부지깽이님께서는 그런 감각, 느낌들을 재빨리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에 덜 들어도 느낌을 살려놓고, 다시 조정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
언의 글을 보니 잠시 제껴둔 산행에서의 체험이 생각나네. 아름다운 놈 용규님께서 실험 도구로 가지고 온 거울이었어. 하늘을 비추니 하늘만 보고 걷는 거라 할 수 있지. 마치 물 속을 헤엄치는 것 같기도 하고, 호수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 예전에 "물 위를 걷는 여자" 란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탈과 위태로움이었다면 어제의 체험은 전혀 달랐지.
자유로움과 한 마리 물고기가 되어 마치 산호초(나무가지 등) 등을 피해 걷는/헤엄치는 느낌이 들었지.
아, 내가 하늘이 바다가 되고 나무가 산호초가 되어 거꾸로 산행을 한 체험/ 물 위를 걷는 듯한 체험도 언의 체험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뒤집어 하늘을 걸으며 세상을 한마리 물고기처럼 헤엄치며, 다름과 변화를 경험한 체험도 삶의 이면이었다는 생각이야. 언의 체험의 경우처럼 상황의 반전에 대한 경이로움과 약간의 두려움도 결국에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 극복해야 할 착한 녀석의 이었던 것 같다. 시각 장애우에 대한 체험으로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한정된 시각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경우에 이입해 더 나은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다는 것도 소중한 일이 될 거야. 그러면서 삶의 지평을 넓혀가게 될 테니까.
VR Left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280 | 살면서 느끼는 소박한 행복 그리고 원대한 꿈 [14] | 현운 이희석 | 2007.08.26 | 2193 |
| 2279 | 김달국사장님께 밥사야할 일을 고백합니다. [5] | 기원 | 2007.08.28 | 1800 |
| 2278 | [40] 근황近況에 즈음하여 [8] | 써니 | 2007.08.28 | 1767 |
| 2277 | 며칠 앓고 나니 [3] | 김지혜 | 2007.08.29 | 1617 |
| 2276 | 음력 7월 15일 [5] | 교정 | 2007.08.29 | 1930 |
| 2275 | 30대 10년동안 해야 할 일 7가지 [6] | 현산 김나경 | 2007.08.30 | 2612 |
| 2274 | '말도 안 되는 구본형 비판'을 읽은 87분께.. [6] | 박안나 | 2007.08.30 | 2385 |
| 2273 | [41] 변.경.연의 오리지널과 짝퉁 [11] | 써니 | 2007.08.30 | 2177 |
| 2272 | 이은미 언니를 찾습니다 ! ㅋㅋㅋ [6] | 박소정 | 2007.08.31 | 1829 |
| 2271 | 잠 못드는 낮 비는 내리고 [14] | 뱅곤 | 2007.09.01 | 1959 |
| 2270 | 어어라?? [1] | ㅅㄴㅇ | 2007.09.02 | 1586 |
| 2269 | 20대 친구들의 이야기 [4] | 김귀자 | 2007.09.02 | 1958 |
| 2268 | 동거묘(猫) 테리와의 나날 [4] | 香仁 이은남 | 2007.09.05 | 1550 |
| 2267 | 자기’ 잃은 ‘자기계발’… 인문학에 길을 묻다 [2] | 지나가다 | 2007.09.05 | 1892 |
| 2266 | 병곤오빠에게 [6] | 다인 | 2007.09.05 | 1597 |
| 2265 | [42] 꿈꾸는 초원의 관광봉고 / 사랑ㆍ여행ㆍ꿈 [2] | 써니 | 2007.09.06 | 1751 |
| 2264 | 구본형 효과 [5] | choi | 2007.09.07 | 2186 |
| » | 소개팅 [3] | 선비 언 | 2007.09.07 | 1832 |
| 2262 | 취미에 대한 이상한 생각 [6] | 김나경 | 2007.09.08 | 1565 |
| 2261 | 식물들도 최선을 다해 산다 [5] | 김귀자 | 2007.09.08 | 1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