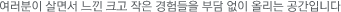
- 한희주
- 조회 수 4091
- 댓글 수 3
- 추천 수 0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애송시의 향연, 참 푸르고 향기로운 축제라 여겨져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박남수 님의 이 시를, 40여년 전 대학 1학년 때 접하게 되었는데 그 즈음의 떨림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개되는 현실이 뜻같지 않아 마음이 가라 앉을 때, 저는 이 시를 소리내어 읊조려보곤 합니다.
애처롭지만 아름다운 뉘앙스가 저의 가슴에 서서히 스며들어
어두웠던 마음이 화안해 집니다.
IP *.221.104.233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애송시의 향연, 참 푸르고 향기로운 축제라 여겨져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박남수 님의 이 시를, 40여년 전 대학 1학년 때 접하게 되었는데 그 즈음의 떨림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개되는 현실이 뜻같지 않아 마음이 가라 앉을 때, 저는 이 시를 소리내어 읊조려보곤 합니다.
애처롭지만 아름다운 뉘앙스가 저의 가슴에 서서히 스며들어
어두웠던 마음이 화안해 집니다.
댓글
3 건
댓글 닫기
댓글 보기
한희주
나무와 새
저는 이 곳 변경연을 생각하면 늘 나무와 새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지난 봄, 백오 님은 행복숲에서 '민들레를 닮으신 스승님'이란 제목으로 스승의 덕을 기리는 애틋하고 간절한 글을 올리셨지요.
그 순간 저의 시야엔 푸르고 무성한 가지에 잎새를 넉넉히 드리운 느티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 가지로 날아들어 저 마다의 목청으로 지저귀는 온갖 새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에 놓이고 저기에 놓이지 않았나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서면 물이 좋을까하여 새로운 자리를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득박(得薄)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양하님은 그의 수필에서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또 장영희 교수는,
'때로는 나무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풍파를 견뎌내는 인고의 세월이, 향기롭지 않지만 두 팔 높이 들어 기도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껴안는 겸허함이 아름답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달이 걸리고 해가 뜨는, 나무는 신만이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라 했습니다.
이 은혜로운 구선생님의 나무와 온갖 새들의 노래 소리 낭자한 변경연은, 배움과 성장과 위안으로 가는 선지(善地)입니다.
그 그늘의 한 켠에 맞닿아 있음은 삶의 축복입니다.
써니님! 명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곳 변경연을 생각하면 늘 나무와 새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지난 봄, 백오 님은 행복숲에서 '민들레를 닮으신 스승님'이란 제목으로 스승의 덕을 기리는 애틋하고 간절한 글을 올리셨지요.
그 순간 저의 시야엔 푸르고 무성한 가지에 잎새를 넉넉히 드리운 느티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 가지로 날아들어 저 마다의 목청으로 지저귀는 온갖 새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에 놓이고 저기에 놓이지 않았나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서면 물이 좋을까하여 새로운 자리를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득박(得薄)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양하님은 그의 수필에서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또 장영희 교수는,
'때로는 나무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풍파를 견뎌내는 인고의 세월이, 향기롭지 않지만 두 팔 높이 들어 기도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껴안는 겸허함이 아름답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달이 걸리고 해가 뜨는, 나무는 신만이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라 했습니다.
이 은혜로운 구선생님의 나무와 온갖 새들의 노래 소리 낭자한 변경연은, 배움과 성장과 위안으로 가는 선지(善地)입니다.
그 그늘의 한 켠에 맞닿아 있음은 삶의 축복입니다.
써니님! 명석님! 감사합니다.
VR Left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180 | 꽃 -김춘수 [4] | 춘희류경민 | 2008.04.26 | 3640 |
| 2179 | 사랑에 관하여 [3] | 서현주 | 2008.04.26 | 3362 |
| 2178 | 키 // 유안진 [3] | 다뎀뵤 | 2008.04.26 | 5358 |
| 2177 |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 호승 [3] | 푸른바다 | 2008.04.25 | 4587 |
| 2176 | [삶의 시]♡동행♡ [1] | 임미정 | 2008.04.25 | 8515 |
| 2175 | 가장 외로눈 날엔"용해원" [1] | 최명자 | 2008.04.25 | 4953 |
| 2174 | 안녕하세요, 어머니. [3] | 김일수 | 2008.04.25 | 3773 |
| 2173 | 능금 -김춘수- [1] | @햇살 | 2008.04.25 | 3917 |
| 2172 | 나는 당신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2] | 世政 | 2008.04.25 | 3857 |
| 2171 | 백두대간을 그리며 [1] | 최인찬 | 2008.04.25 | 3609 |
| 2170 | 기탄잘리 [3] | 김신효 | 2008.04.25 | 3191 |
| 2169 | 구본형선생님께 여쭙습니다. [7] | 죄송한 사람 | 2008.04.25 | 3296 |
| 2168 | 첫마음[정채봉] [1] | 권상윤 | 2008.04.25 | 6562 |
| 2167 |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7] | 현운 이희석 | 2008.04.25 | 6205 |
| 2166 | 호오포노포노 [3] | 하늘빛 | 2008.04.25 | 5824 |
| 2165 | 아가Song of Songs [2] | 개구쟁이 | 2008.04.24 | 3169 |
| 2164 | 제비꽃 편지/안도현 [2] | 이은미 | 2008.04.24 | 3873 |
| » | 새-박남수 [3] | 한희주 | 2008.04.24 | 4091 |
| 2162 |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4] | 소은 | 2008.04.24 | 3903 |
| 2161 |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1] | lover | 2008.04.24 | 28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