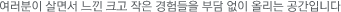
- 난다
- 조회 수 4295
- 댓글 수 6
- 추천 수 0
모든 과제가 힘들었고 즐거웠지만, 이번만큼 힘들고 즐거운 과제가 없었다. 처음 과제물을 받았을 때부터 벼르고 벼르던 과제였다. ‘이번 과제는 나를 위한 과제다. 나는 역사는 잘 모르는데, 시라니! 행운의 여신이 나를 위해 만든 과제다’ 그것은 내가 시를 많이 읽거나 시를 잘 알아서가 아니다. 나는 시를 좋아하고 싶었고, ‘시가 내게로 왔다’고 김용택 시인처럼 멋지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제가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의 시집깨나 있을 만한 지인들에게 SOS를 쳤다. 다른 이야기를 안하고, 시집 좀 가능한 많이 빌려달라고. 좋은 시 33편을 골라야 한다고. 시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한 친구는 ‘뭔 시가 과일 고르는 것도 아니고, 어찌 한달 만에 읽고 고른다냐?’ 하면서 미루는 것도 없이 다음날 수십권의 시집을 싸들고 우리 집까지 와주었다. 또 한 친구는 ‘어떤 시? 어느 시대부터?’ 하면서 '참, 주문이 난감하다'고 하면서도 50권이 넘는 시를 트렁크에 실고 집으로 와주었다. ‘니 성향을 생각해서 최근의 작품들로 준비해 왔어’ 라는 말을 하면서 시집을 놓고 갔다. 오늘 내가 고른 33편의 시는 모두 그 친구들의 덕이다. 기존에 알고 있던 교과서의 시인들이나, 영문학 시인들 외에 지금 이 시기를 가슴으로 쓰고 있는 시인들을 만나보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은 90년대와 2000년대 출판된 시집들을 가져다 주었다. 이심전심이라고 했던가.... 이렇게 '시강림'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무작정 백 여권이 넘는 시집을 소설책 읽듯이 읽기 시작했다. 역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시집은 손에 꼽았고, 대부분의 시집들은 읽어야 한 권에 한두 편의 시들만 이해가 갔다. 이런 낭패가 있나. 그래도 명색이 문학 전공자인데.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여태 시집을 잘 안 읽었던 것이지. 갑자기 잘 읽어지겠어?’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면서, ‘이제 자판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시를 골라야 한다. 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를 골라야 한다. 이렇게 여유 있게 시집을 읽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시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하루에 열권이 넘는 시집을 읽어도 잘 골라지지 않는다. 그러다 5일째 되는 날부터다, 신기하게 시들이 읽혀진다. 촉각이 서고, 코가 시큰해진다. 이야기가 엮이고, 주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너무 많은 시들이 가슴에 와 닿아서 고를 수가 없었다. 큰일이다. 33편을 골라야 하는데, 일단 주제를 잡아야했다. 처음 떠오른 것은 김광석의 노래와 함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그래서 노래, 사랑, 삶이라는 목차로 시를 엮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가 노래가 된 작품들, 내 삶을 투영한 시들, 그리고 내 사랑을 보여줄 시들, 그런 식으로 시를 분류하고 고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33편을 고르고 보니 식상한 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또한 삶이라는 주제가 너무 두리 뭉실 주제가 안보였다. 사랑도 온갖 사랑의 감정이 다 실려 있었다. 내가 보기에 각자의 시들은 모두 훌륭한 시들이었다. 하지만 나의 시집을 엮는 것인데,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 모음집’이 되고 말았다. 시간이 없었지만 다시 시작했다. 이틀의 시간이지만 일단 읽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 '소주제를 다시 편성하자' 그러면서 내가 고른 시들을 다시 보니 예닐곱 개를 빼면 한 가닥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 보였다. 그것은 정말 나의 스토리였다. 신들의 세계에서 있음직한 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의 청춘, 나의 방황, 나의 업,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다시 시집들을 보기 시작했다. 내 과거와 현재를 엮어가면서, 나를 보고 다녔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 울컥하는 감정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다. 작업을 하다 어느 날 새벽에는 결국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달이 밝았다. 음력 2월 19일 새벽의 달. 달은 밝고 구름은 달을 잡았다, 놓았다. 바람은 불고, ‘달 밝은 밤에 기러기’라더니, 정말 기러기들이 날아간다. 물론 보이지 않았다. 끼룩, 끼룩, 앞서 우는 새, 뒤에 우는 새,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 운명 같은 만남일까?
초등학교 사오학년 때쯤이었다. 방학 숙제로 글짓기가 있었는데 동시를 하나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작은 방 아랫목에 누웠다. 눈을 감고 감성을 일으키고자 애를 써봤더니, 논 위에 가을걷이하고 남은 이삭들을 주워 먹던 새들의 풍광이 그려졌다. 그들의 움직임이 망원 렌즈로 잡아 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신기하게도 경景이 그려지니 정情이 일어났던 기억이다. 마치 이동하는 새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나는 '겨울새'라는 시를 썼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날의 내 감성은 삼십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또렷하다.
시를 쓰고 싶었다. 서문을 시로 장식하고 싶었다. 허나, 마음만 앞서 있는 것. 그 마음이 서문을 쓰는 데 드러났다. 문장에 힘이 들어가더니, 세 줄을 넘길 수가 없었다. 과도한 은유와 상징들로 넘치는 문장들. 산문을 쓰는데 이렇게 힘이 들다니! 옛날 작가들이 한 줄을 쓰고 종이를 구겨 집어 던지고, 또 몇 줄을 쓰고 종이를 날리고 하던 심정이 이랬으리라, 나는 한 줄을 쓰고, 새 문서를 만들고, 또 몇줄을 쓰고 새 문서를 만들고, 버리지도 못하고 좁은 윈도우창이'서문'이라는 한글 파일로 꽉 채워졌다. 욕심이 앞서 있었다. 정말 멋지게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수 가 없었으리라. 그래 원래대로 하자, 멋지지 않으면 어쩌랴, 내 평소대로 산만하고 내 감정이 줄줄 넘치더라도 그냥 쓰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욕심을 안내고 서문을 다시 쓴다. 벌써 한 페이지가 넘었다. 워낙 글을 길게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나로서는 정말 말이 많은 글이다. 시를 읽어서 생긴 나쁜 글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행복하다. 시가 내게로 왔으므로. 책상 주변,방안 곳곳, 머리맡에 할 것 없이 내가 눕고 앉아있는 옆에 시집이 있었다. 이러 누워도 시집, 저리 누워도 시집, 행복한 잠자리였다. 이번 기회로 잠자리 주변에 시집을 쌓아두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많은 시인들 중에서 유독 마음에 와 닿는 시인이 생겼다. 그래서 그 시인들의 시들은 모두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 시인 당 한 편 이상은 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를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시인의 시는 두 편 이상이 되었다. 시들에게 다가갈 수록, 불면의 시간들이 길어졌고, 한 때는 우울을 겪고, 한 때는 공황 상태를 겪기도 했다. 모두가 시가 내게로 오는 길이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79 | 시대 / 서찬휘 [2] [2] | 형산 | 2008.05.19 | 4217 |
| 178 | E non ho amato mai tanto la vita! [4] [13] | 햇빛처럼 | 2011.06.03 | 4217 |
| 177 | 나 [3] [2] | 백산 | 2008.08.27 | 4225 |
| 176 | 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 김현승 [1] [2] | 나경 | 2010.06.11 | 4254 |
| 175 | 체로키 인디언의 축원 기도 [2] | 춘희류경민 | 2008.04.29 | 4258 |
| 174 | 詩 {청춘} - 사무엘 올만 저 | 김지현 | 2008.05.04 | 4261 |
| 173 | [014]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 박노해 | 햇빛처럼 | 2012.11.13 | 4267 |
| 172 | [잡담]아이들과 함께하는 게임 두개.. | 햇빛처럼 | 2012.01.14 | 4273 |
| 171 | 뻘에 말뚝 박는 법/ 함 민복 [4] | 푸른바다 | 2008.04.28 | 4285 |
| 170 | 보름달문을 열고 들어가 [2] [2] | idgie | 2008.09.12 | 4296 |
| » | 4주차 과제-8기 예비 연구원(허정화)-내 인생의 33편의 시- 서문 [6] | 난다 | 2012.03.12 | 4295 |
| 168 | [97] 나의 애송 시(인생찬가- 롱팰로우) [8] | 써니 | 2008.04.21 | 4312 |
| 167 | 몸과 마음이 아플 때 | 한수진 | 2011.02.25 | 4319 |
| 166 | -->[re]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 [2] | 에르빈 | 2003.05.26 | 4321 |
| 165 |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마음 [5] | 사무엘 | 2008.10.05 | 4332 |
| 164 | 사원의 문 앞에서 -칼리지브란 | 류춘희 | 2008.05.05 | 4335 |
| 163 | ---->[re]나의 어설픈 견해 [2] | 이동훈 | 2003.02.02 | 4339 |
| 162 | 아름다운 마음을 열기위한 작은 노력 ! [1] | 유민자 | 2003.06.09 | 4341 |
| 161 |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젊은이 [2] | 박창옥 | 2003.02.13 | 4342 |
| 160 | [버스안 시 한편]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 정야 | 2014.09.13 | 4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