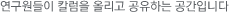
- 書元
- 조회 수 2325
- 댓글 수 1
- 추천 수 0

이곳은 죽은 이의 집이다. 두발을 땅에 디뎌 살아가는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이승을 떠난 분들이 쉬어가는 공간 말 그대로 공동묘지이다.
내가 이곳을 처음 방문한 때는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이었다.
학교 뒤편에 있는 무덤을 단체로 방문한다고 하였을 때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많고 많은 장소에서 왜 굳이 이곳을 견학한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그들은 도심 이곳에 무덤을 만든 것일까.
여드름투성이 아이들의 군무에 섞여 멀찍이 홀로 숨어서 나는 이곳을 찾았었다.
어릴 적 난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라는 이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병약한 몸으로 병원신세를 적잖이 보내었기에 과연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살지라는 불안감이 베여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왠지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에 나올법한 그렇고 그런 묘지가 아니었다.
으스스한 느낌이 아닌 한낮이 아닌 밤중에 찾아오더라도 그렇게 떨리지는 않을 묘한 감정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다.
왜 그랬을까.
다시 이곳을 방문한 때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시절 성당 교리 반을 다닐 무렵이었다.
성지 방문차 이곳을 찾았고 안내자의 설명으로 그제야 이곳이 왜 그때 일반 공동묘지처럼 무서운 기분이 들지 않았나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곳은 일반 사람이 아닌 가톨릭 사제로써 생을 마감한 분들이 계시는 성직자 묘지였던 것이다.
그랬었구나.
세례를 받을 즈음 수단을 입은 신부라는 대상이 무척 멋있게 다가왔었다.
죽음이라는 명제를 상징하는 까만색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분들.
하지만 세상사가 그러하듯 그 세계에서도 일반인인 우리가 모르는 애환들이 있었다.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생을 검은색의 옥쇄에 스스로를 감금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터였다. 거기다 독신으로 살기에 일상사에서도 더욱더 자신들을 수련해 나가야 했을 터. 더욱이 신의 대리자로 선택되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한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관 두껑을 덮고 입관시 지금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때서야 신이라는 절대자에게서 이 길을 불림 받았다는 것을.
오롯한 한길을 숙명처럼 걷는 그들.
나도 그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그때는 보지 못한 묘한 글씨가 입구에 새겨져 있다.
‘HODIE MIHI CRAS TIBI‘
무슨 뜻일까?
안내자는 설명을 한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지.
죽음을 상징하는 명제란다. 즉,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건네주는 말로써 오늘은 이 묘지에 내가 있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죽음을 잘 대비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죽음.
초등학교시절 한 꿈을 꾸었다.
잠을 자며 누워 있었는데 언뜻 의식이 들어 일어나려고 하니 나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뭐야. 왜 이러지. 당황이 되어 손가락을 까닥여 보아도 목을 움직이려 하여도 꼼작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무언가가 다가왔다. 모습은 기억나질 않으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무언의 공포의 엄습.
온몸의 털이 갈기갈기 솟구쳤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목젖은 순식간에 바짝 타올랐다. 힘줄이 솟고 살갗은 차가운 느낌으로 식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의식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뿐. 내 몸은 시체처럼 굳어 있었다.
뭐야. 도대체 왜이러는거야. 정신 차려. 도망가야 해. 이렇게 있다간 저놈에게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보란 말이야. 살려줘요.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도망가야 해.
그러다 잠이 깨었다. 온몸은 흠뻑 젖었고 꿈속의 느낌은 생생해 잠시 여기가 어디인가 둘러보았다. 살았구나.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나의 이런 모습에 한마디씩을 하였다.
“가위에 눌렸구먼. 괜찮아. 큰다고 그러는 것이니까.”
큰다고 그러는 것이라고. 무슨 소리지. 나이가 들면 저절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 꼭 이렇게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사십대로 접어들 즈음 모임에서 장례식이라는 가상의 프로그램을 거행한 적이 있었다.
본인이 죽는 순간을 가정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친지들에게 낭독하는 것이었다.
눈물을 흘쩍이며 숙연한 분위기속에 앞사람들의 낭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왠지 두렵지 않았다. 그냥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온 마무리를 즐겁게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그만큼 잘살았던 것일까. 아니면 죽음이라는 숙제를 숨결깊이 묵상을 하지 못하고 참석을 하여서 그런 것일까.
오늘도 이곳 죽은 이의 집에는 산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학생, 순례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 깔깔대는 아줌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그리고 왁자지껄 소풍을 온 듯한 유치원 꼬맹이들의 참새들 소리.
그들은 이곳을 찾아 헌화를 하고 숙연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여 참배를 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러 온 것일까.
죽은 이에 대한 묵상의 노래일까.
현실 삶에 대한 가슴속 옹알이일까.
힘겹게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기도를 청하는 것일까.
아니면 당신처럼 살게 해 달라는 것일까.
마눌님이 얼마 전 한마디를 건네었던 말이 떠올려졌다.
“승호씨, 죽으면 우리 제사상은 누가 차려줄까.”
그렇군. 망자를 찾는 누군가의 사람은 있어야 되겠군.
나는 왜 이곳을 찾은 것일까.
답답해서.
아니면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내가 가진 소원을 빌기 위해서…….
죽은 이의 집에 산자가 찾아온다.
언제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동반자가 되어 함께 차가운 흙바닥에 자리를 펴고 누울 그네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웃긴다.
나는 여기에서도 현실의 산을 부둥켜 안기위해 헤매고 있으니.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212 | #8 신곡 '지옥편'을 읽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15] | 터닝포인트 | 2012.05.28 | 1964 |
| 2211 | 청소년들에게 천국을 [5] | 세린 | 2012.05.28 | 1771 |
| 2210 |
나의 베아트리체 : 나에게 종교란? | 샐리올리브 | 2012.05.28 | 2302 |
| 2209 | 신곡의 여정속에 얻은 기쁨 [5] | 학이시습 | 2012.05.28 | 1785 |
| 2208 | 종교 순례기 [10] | 콩두 | 2012.05.28 | 1912 |
| 2207 | #8. 지옥과 천국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10] | 한젤리타 | 2012.05.28 | 2006 |
| 2206 | 징겸 단상 [4] | 장재용 | 2012.05.28 | 1696 |
| 2205 |
단상(斷想) 102 - 가족 | 書元 | 2012.05.28 | 1945 |
| 2204 | 쉼표 일곱 - 쟁취하는 삶에서 추구하는 삶으로 [6] | 재키 제동 | 2012.05.28 | 2019 |
| 2203 | 어수선한 방안 정리기 [8] | 루미 | 2012.05.28 | 2052 |
| 2202 | #32. 신치의 모의비행 - 관계 외 [13] | 미나 | 2012.05.29 | 1653 |
| 2201 |
장난감, 사줘 말어? | 양갱 | 2012.05.29 | 2511 |
| » |
단상(斷想) 103 - 죽은 이의 집에 산자가 찾아온다 | 書元 | 2012.06.03 | 2325 |
| 2199 | #9. 책,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다 - 터키판 데카메론 [14] | 한젤리타 | 2012.06.04 | 2222 |
| 2198 |
쌀과자#9_소청에서 중청(나의 순례길초입에서) | 서연 | 2012.06.04 | 1898 |
| 2197 |
필로메나가 독일 두 여제의 대결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 샐리올리브 | 2012.06.04 | 2302 |
| 2196 | 기어이 가야 하는 길 [5] | 장재용 | 2012.06.04 | 1818 |
| 2195 | 나의 글짓기 역사 [5] | 세린 | 2012.06.04 | 2125 |
| 2194 |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 [12] | 콩두 | 2012.06.04 | 2473 |
| 2193 | 깊은 이야기로 마음을 열었던 밤 [5] |  | 2012.06.04 | 24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