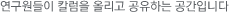
- 에움길~
- 조회 수 2131
- 댓글 수 0
- 추천 수 0
■칼럼23■
짐작과는 다른
나는 지금, 르네 마그리트를 보고 있다. 정확히는 그의 그림을 보고 있다. 아니지, 애초 정확이라고 하였으니 정확이라는 말에 갇혀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얘기해보자.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책으로 낸 마그리트의 그림집을 보고 있다. 단순하던 머릿속이 그의 그림을 접하면서 더욱 단순해지는 것 같았다가 점점 더 복잡해져갔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림에 와서야 절정에 달했다.

파이프 하나를 그려놓고 알 수 없는 흘림을 써 놓은 그림이다. 덕분에 사람 머리가, 아니 내 머리가 조일 지경인 그림이다. 그림 밑의 글씨를 글씨가 아니라 그저 그림으로만 보다가 이후 뭐라고 써 놓은 거야라는데 생각이 미쳤고 아, 이것이 뜻을 가진 글자구나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그것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내게 다가왔고 잠시 프랑스어를 배웠던 한때의 추억이 기억났다.
근 1년을, 배운 것 같다. 알퐁스 도데의 ‘별’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하는 프랑스어를 말이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은 봉쥬르(Bonjour), 마드모아젤(mademoiselle), 며-얼-치-볶-음(Merci beaucoup : 불어 선생님 앞과 시험지 앞이 아닌 일상생활에선 ‘메르시 보꾸’를 이렇게 적용하고 다녔더랬다), 께스크 세(Qu'est-ce que c'est)와 싸 바?(Ça va)라고 하며 끝을 올리는 억양뿐이다. 또한 콧구멍이 간질거리는 듯한 그 비음까지.
언제나 프랑스어는 이렇게 두 가지 기억으로 온다. 알퐁스 도데의 ‘별’에서부터 각인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 콧구멍을 벌렁벌렁하며 잔뜩 ‘푸왕, 스왕’거리는 코미디 프로에서 즐겨 사용하는 웃음의 언어라는 것. 자국어에 대한 지나친 자긍심으로 타언어를 배척하는 프랑스인에 대한 반감은 코미디 프로의 프랑스어 희화화를 보다 보면 좀 수그러드는 것 같다. 어쩜 나도 요런 식으로 은연 중 내 모국어에 대한 좀 격한 자긍심을 누리는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 모국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통의 도구였고 프랑스어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프랑스어 수업을 듣던 고교시절, 프랑스어 철자를 읽으면서 그저, 무조건 영어랑 헷갈리게 만들었네라고 생각했던 게 다일 뿐이다. 그럼에도 프랑스어의 기본 철자를 익힐 때까지는 오히려 영어철자를 프랑스어 식으로 읽었다.
“아- 베- 쎄- 데- 으- 에프- 제…….”
아마도 내게 있어 프랑스어가 길게 자리한 때는 영어알파벳 발음을 잊을 정도였던 고등학교 1학년 잠시의 봄, 뿐이다. 이후로 프랑스어는 떠나버린 불어 선생님처럼 사라져버린, 존재자체가 파악되지 않은 언어일 뿐이다. 프랑스어는, 영어라는 필수품목에 가려진 경쟁력 없는 선택품목에 지나지 않았다. 영어가 우선이어야 하는 삶, 그조차도 의사소통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인식하며 배워나가기에 프랑스어는 영원히 소통되지 못할, 버려질 세계가 되었다.
아, 뭐 때문에 내가 프랑스어가 어쩌구 저쩌구 떠들어 대고 있었지?
다시, 생각이 그림으로 돌아오자 멀쩡한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마그리트의 생각을 읽어 내느라 머리에 쥐가 내릴 지경이다. 이럴 때 누군가 전화를 걸어온다면 나는 마그리트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 대신 거두절미하고 ‘머리에 쥐나’라고 해댈 것이고 필시 전화를 건 놈이거나, 년이거나 담담히 (우습지도 않은 농담으로) ‘고양이를 풀어’라고 맞받아칠 것이다. 그리고는 제 센스에 스스로 꺄르르 웃어제낄 것이다.
앞뒤 자르고 무턱대고 제 하고픈 이야기만 동강대며 이야기하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습관처럼 된 지난 세월이었다. 한국말처럼 사설이 기인 언어습성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텐데 나를 비롯한 내 주위사람들 모두가 댕강댕강 앞뒤 뚝 자른 채 대화를 하고 그로 인해 몇 번이나 대화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그렇게 더 복잡하게 이뤄지는 대화를 해대다가 뒤에서야 그 속에 감춰진 말이 무엇인지 앞뒤에 생략된 말들을 퍼즐처럼 끼어 맞추며 혼자 분을 삭이기도 하고 빙그레 웃어보기도 하며 결국엔 내 해석에 맞추어 웃고 떠들던 그런 시절이었다.
이런 대화의 맥락에 마그리트의 그림도 쏘옥 끼워 주고 싶다. 당장에는 오냐 오냐 너 참 그림 잘 그렸다. 내가 박수쳐줄게 하고 나선, 너 지금 장난하냐? 이게 뭔 그림이야? 바로 머릿속이 거대한 미로처럼 얽혀 버리는. 비단 머리에 쥐 내리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던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은 항의가 많이 들어와 벽에서도 천장 쪽 가까운 아주 높은 곳에 작품을 매달아 놨다고 한다. 사람들이 우산으로 그의 그림을 찢으려 했기 때문이라나. 고개를 들자 모빌처럼 대롱대롱 거리고 있는 그의 그림들이 연상되었다.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걸 꼭 유난스럽게 구는 족속들이 있다. 제 딴에야 자신과 다름은 옳지 않음이라 생각한다거나, 자신이 수용 못할 것들은 당연 남들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거나, 아예 존재하는 것 자체를 참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 말이다. 각기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라 하건만 그렇게 제 취향을 유달시리 강조하는 족속들 때문에 쭈욱 쭉 무시받아야 하는 생이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