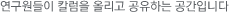
- 정수일
- 조회 수 1493
- 댓글 수 1
- 추천 수 0
졸라인연.
2015. 2. 1
“교수님 진짜 감사해요. 그 동안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혼자 계속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왔었는데 교수님 말씀 덕분에 여러 가지 제 생각이 정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플랫폼으로 내려서 일찌감치 기차에 올랐다. 점심 무렵부터 시작된 酒님의 은총으로 한껏 늘어진 몸은 조갯살에 버무린 알콜찌게같다. 어제는 무려 새 개나 되는 회의와 미팅을 소화하고 오늘은 이번 달 오프에서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려고 목요모임을 하루 당겨 그리운 사람들을 만났다. 낮술은 자유라 외치는 사람들과 마시는 백주의 음주는 정말이지 자유다. 허리띠 풀어놓고 먹는 한 끼 식사 같은 푸근함과 여유로 움이 좋다. 퍼지는 알코올 속도만큼 피로가 몰려온다. 깊숙이 의자에 몸을 묻었다.
복도 건너 뒷자리의 두 아가씨는 아까부터 심각하다. 창가에 앉은 아가씨는 걸쭉한 부산사투리에 목청까지 좋다. 친구의 목청이 짐짓 신경 쓰이는 서울 말투의 아가씨는 보다 조심스럽다. 대화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그녀는 여행 삼아 부산 사는 친구를 따라 나섰다.
“너무 예쁜 아가씨들이 예쁜 목소리로 이야기 하는데 ‘졸라’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겠어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이렇게 써서 가까운 서울 말투의 아가씨에게 건넸다. 기분나빠하지나 않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한다. 반듯한 친구들이다. 그렇지. 무조건 두고 보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이야. 그녀들은 다시 하던 이야기로 빠져 들었다. 목소리에 삼감이 조금 더 묻었고, 이후로는 ‘졸라’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이어폰을 통해 듣는 것 마냥 귓전에서 들렸다. 부산 아가씨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고 싶어진 모양이다. 일반 대학에 갈 것이지 사이버 대학을 갈 것인지 고민이라고 했다. 서울 아가씨가 걱정을 했다. 일반 대학에 가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이고, 사이버 대학은 좀 그렇다는 것이다. 다시 부산 아가씨가 받았다.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건 아깝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그만큼 보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는 두 시간이 다 되도록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본의 아니게 대화내용 들었어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과 닿아 있어서...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 선 취업 후진학에 관한 일에 조금 참여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다시 이렇게 적어 명함과 함께 건넸다. 걱정과는 달리 이번에도 반가워하는 표정이다. “감사합니다.” 이윽고 내리는 뒤통수에다 우람한 목소리로 작별인사를 한다. 부산아가씨는 기본적으로 소리통이 무척 큰 친구다.
다음 날 오전, 생각보다 일찍 연락이 왔다. 제법 긴 시간 통화를 했다. 그녀는 더 성장하고 싶어 했다. 고졸자라는 핸디캡을 벗어버리고 싶어 했다. 지금 하는 일과 직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교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이야기하기가 편했다. 나는 그녀에게 바탕이 되는 ‘진짜 실력’과 ‘꿈’ 그리고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생산적인 고민과 실제적인 경험을 해 본 친구들은 '방향'과 '가치'에 대한 가닥을 잡게 해 주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낸다. 사이버 대학에 가는 것이 좋으니 일반대학에 가는 것이 좋으니 따위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냈다.
“교수님! 근데 꿈이 뭐에요?”
“글쎄다.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아! 진짜요? 또 전화 드려도 되요?”
“안될 거 있겠냐?”
“교수님 학교 가면 안되요?”
“집 가까운데가 가장 좋은 학교다.”
3월이면 다시 학생들을 만난다. 나는 1,2학년 수업을 매우 힘들어 한다. 무기력한 눈을 마주하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이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길 잃은’ 아이들이다. '방향'을 갖지 못한 청춘들이다.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무겁다. 정해진 답만 찾는 훈련을 해 온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몹시 힘들어 한다. 내 젊은 시절의 방황을 투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안타갑다. 한학기의 반은 언제나 잔소리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야지” 다짐을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아예 커리큘럼의 반을 잔소리로 만들어 버렸다. 호불호가 없지 않지만 제법 인기 있는 강좌가 되었다.
“샘~~이 자격증만 따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거에요?” 달포 전쯤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한 말을 가슴에 품기로 했다. 어른들이...가르치는 선생이 잘못한 것이 많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412 | 12월 오프수업 후기 및 과제- 저자들과 함께한 시간 [1] | 왕참치 | 2014.12.14 | 1497 |
| 4411 | 화목하게 어울리기 | 이지원 | 2011.07.07 | 1498 |
| 4410 | 4주 -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 우주, 신 [1] | 콩두 | 2020.09.04 | 1498 |
| 4409 | #3. 힐링의 공간, 살롱9 [6] | 쭌영 | 2013.05.14 | 1500 |
| 4408 | #33. 장자를 읽는다는 의미 [5] | 쭌영 | 2014.01.19 | 1500 |
| 4407 | 12월 오프 수업 과제 - 이동희 | 희동이 | 2014.12.16 | 1500 |
| 4406 | No 40 책을 쓴다 ? | 미스테리 | 2014.02.04 | 1501 |
| 4405 | 이야기 속에 3+1의 비밀 [1] | 타오 한정화 | 2014.06.03 | 1501 |
| 4404 | #35 - 황금의 씨앗 [1] | 희동이 | 2014.12.22 | 1501 |
| 4403 | 1월 과제 및 후기 및 책목록 [1] | 어니언 | 2015.01.13 | 1502 |
| 4402 |
피그말리온과 앤서니 브라운의 [터널] | 정승훈 | 2020.07.17 | 1502 |
| 4401 | [11월 3주차] 어디로 가고 있는가? [4] | 라비나비 | 2013.11.11 | 1503 |
| 4400 |
역사에 대한 나의 역사 | 왕참치 | 2014.05.18 | 1503 |
| 4399 | 비교의 경제학 [1] | 정산...^^ | 2014.06.03 | 1503 |
| 4398 | 흔들리는 세상, 중심에 서다 [2] | 유형선 | 2014.07.05 | 1503 |
| 4397 | 10월 오프 수업 후기 - 희동이의 인터뷰 [7] | 희동이 | 2014.10.14 | 1503 |
| 4396 | 매일과 함께 [4] | 왕참치 | 2014.10.27 | 1503 |
| 4395 | #41. IT책 쓰기 [3] | 쭌영 | 2014.03.17 | 1504 |
| 4394 | [26] 시련극복 5.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 [5] | 앤 | 2008.10.27 | 1505 |
| 4393 | Climbing - 9. 깡 [1] | 書元 | 2013.05.26 | 1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