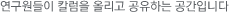
- 범해 좌경숙
- 조회 수 2854
- 댓글 수 6
- 추천 수 0
응애 4 -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사람이 아프면 그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공헌을 해왔건 그는 환자 ***로 기록된다. 그를 담당하는 의사는 00 이며 성별과 나이가 기재되어 병실 침대에 꼬리표처럼 달아놓는다. 환자의 정체성이 그렇다. 그러나 환자는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가 병실로 친지를 찾아가게 되면 우선 병원 입구의 매점에서 만나서 음료수를 한박스 챙겨들고 병실로 간다. 각 층에 있는 데스크에 가서 환자의 이름을 말하면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보고는 어느 방이라고 알려준다. 물론 우리는 사전에 병동과 병실의 호수를 듣고 가지만 갑자기 긴장이 되고 똑같은 방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혼돈이 와서 다시 물어 확인을 하게된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서 활기차게 문병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충격으로 보호자까지도 이미 지쳐있는 경우도 있다. 간혹 환자 혼자만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도 있다.
문병을 가야할 때 상냥하게 인사를 잘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과 함께 가면 참 편안하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눈인사를 하고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모든 인사를 대표로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조금 걱정하며 병실로 들어서는 마음이 무겁다. 매우 드물게 환자가 수술과 관련하여 자신의 무용담을 큰소리로 말해줄 때가 있는데...이런 경우엔 문병을 갔다가 오히려 기운을 잔뜩 받고 돌아오게 된다.
앞으로 몇 번의 칼럼은 호스피스와 리빙 윌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요즈음은 외과의사와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을 주로 읽고 있는데,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체험을 기록하고 독자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책을 보면 고맙기 그지없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잘 이해하도록 해주기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실제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일러주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자질이 없어서 도울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병의 위중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돕지 못한다. 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혼란과 혼돈을 초래해서 환자를 가족과 친구에게서 떼어놓고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 슬픔이 끝나야 비로소 아픔을 달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환자와 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감정과 반응을 공부해 두는 것이 혼란과 어색한 침묵, 그리고 미묘한 후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잘 처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끝은 죽음이며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금기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을 떼는 사람을 사람들은 피해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더더욱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사회의 바깥에서 떠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점차 외톨이가 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버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건강과 생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또 노인들이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드물어진 것, 곧 질병과 죽음이 점차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졌고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우리시대의 가치관을 영성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한편에서는 꾸준히 죽음이 삶을 끝낼 수는 있으나 삶의 의미마저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들의 임종을 돌보고 서로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 그런 헌신 중의 하나인 호스피스 활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말하는 것과 경청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아야겠다.
매우 자립적이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도 병상에 누우면 친구가 필요해진다. 평온하고 조용할 때에는 사실 별 무리없이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서먹한 느낌이 들 때에는 어디에서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물론 평소에 쌓아놓은 신뢰가 가장 필요할 때이지만 바쁜 일상에 마음만 바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대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냥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어른이 되고나면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꼭 금도끼를 찾으러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 듣기도 전에 바로 팔뚝을 걷으며 연못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나는 평소에 나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지 않는다.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는 것은 나 혼자로도 이미 충분하다. 왜 남의 등에 나의 짐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나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게로 와서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늘 해결사로 나서며 팔을 먼저 걷어 올렸다. 모순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만약 내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팔을 둥둥 걷어 올려도 그의 나무도끼를 건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고립무원에 흐느껴 울고 있을 때 내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나를 실컷 웃게 해준 고마운 분이 계셨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위로였고, 놀라운 보살핌이었다. “나는 지금 울고 있어요....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하다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었는지 그만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마구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내가 또 우스웠다. 울다가 웃으면 어디어디가 어떻게 된다하던데....... 한 30분을 이야기했다. 사실 나는 지금도 그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다만 시작은 나의 “저 지금 울고 있어요” 라는 말이었고 마침은 그분의 “ 그럼 전화를 끊고 또 우십시오.” 였다. 나는 두고두고 이때의 일이 신기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날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웃는다. 고통 속에서 한바퀴를 살짝 돌아 맛이 갔는지 아니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내가 끌어올려진 것인지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분은 경청의 대가였다.
잘 듣는다는 것은 미묘한 기술이다. 물론 말하는 사람에 따라 대화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과 훌륭한 경청자가 만나면 정말 이상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치유의 효과도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질병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깊은 마음속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도울 마음이 있으면 우선은 편안히 앉아서 느긋하게 환자와 얼마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눈을 맞추어주는 것으로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
잘 듣기 위해서는 환자가 하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고, 대꾸할 말을 미리 준비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또 환자의 말을 가로막지 말고 그대신 환자가 당신의 말을 가로 막으면 환자가 말을 하도록 하고 말을 멈추어라.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격려를 보내주고 갑자기 말을 멈춘다면 아픈 상처나 민감한 문제에 닿았을 수가 있으니 조용히 기다려주어야 한다. 비록 그 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재촉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나이 많은 환자는 회상을 통하여 자기의 삶이 의미 있었음을 재확인하곤 한다. 추억을 나누는 것은 씁쓸하고도 달콤한 일이다.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고도의 경청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최대한 이해하는 방법이다. 절대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친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잘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잘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이 친구를 도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