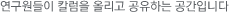
- 이은주
- 조회 수 2418
- 댓글 수 4
- 추천 수 0
킁킁킁 ~ 인간이 잃어버린 마음의 한 조각을 찾아라
인간이 잃어버린 마음의 한 귀퉁이를 찾아 나섰다. 엄마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커피 잔을 들고 마시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창 밖을 내다 보고 있다. 커피 광고 여주인공처럼 분위기를 잡고 즐기는 것 같지만 절대 아나라는 것을 창에 비쳐진 그녀의 눈동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비오는 저녁 앞 차가 밟은 브레이크 붉은등이 젖은 도로에 흔들리 듯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외로운게 틀림이 없다. 그 모습은 막 배달되어 온 둥근 피자에 한 조각 빠진 빈자리처럼 허전해 보였다. 나는 그 빈 자리를 채워 주고 싶은 마음에 슬그머니 옆에 가서 엄마의 무릎에 턱을 올려 놓았다. 백발백중 엄마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내 머리위로 올라온다. 크! 성공이다. 엄마의 잃어버린 마음 한 구석의 쓸쓸함을 내 부드러운 털의 감촉으로 채우는 듯 해 보였다. 나 역시 엄마의 따스한 손길이 내 머리와 코 잔등 위를 살살 만져줄 때 눈이 스르르 감기며 바랄 것 없이 만족했다. 육지에서 살다가 바다에 적응한 고래처럼 어느새 오리오 나는 인간의 음식을 즐겨 먹고 사람들의 손길을 따라 다녔다. 왕왕대는 사람들과 멍멍대는 우리들간의 동반자의 지위에 놓인 처지인 반려동물로서 동고동락하며 살을 맞대며 서로 기대어 편히 살고 있었다. 뭐 우리 조상들이 본다면 억울해 묘자리 제대로 없는 땅 속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보고 싶겠지만 세상의 흐름이 트랜드라 하니 내 천복이지 싶다.
엄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애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눈이 소복히 쌓였으니 우리 나가서 한바탕 뛰어 볼까?” 엄마는 내 체온과 털을 만지며 핸드폰 충전되듯 에너지가 만땅이 된 것인지 갑자기 힘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쳐지는 기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는 엄마의 오버 액션임을 이미 나는 알고 있다. 이럴 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떡 벌어진 가슴을 가진 왕자가 나타나 꼬옥 안아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 나라도 안아 주자 싶은 마음에 엄마에게 가슴을 뒤로 제치고 무조건 들이 댔다. “오리오 너 왜 그래? 나가자니까 추워서 싫다고 지금 나한테 대드냐? 넌 싫으면 집에 있어. 방울아 우리만 나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울이는 엉덩이를 씰룩씰룩 흔들어대며 겅중겅중 뛰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와 철 없는 방울이가 남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다. ‘방울이 너야 몸이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털옷을 두텁게 입었으니 기쁘겠지만 난 추워서 싫다’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빼꼼히 밖을 한 번 내다보고 돌아설 무렵 몸이 번쩍 들렸다. “오리오, 어딜 도망가.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아무도 밟지 않는 저 새 하얀 눈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오케이?” 엄마는 또 우리를 데리고 러브스토리 영화를 한 판 찍을 셈이다. 도대체 누가 개들은 눈이 오면 좋아한다고 했는지 찾아내고 싶었다. 사실 발이 시려워 뛰는 모습을 사람들은 좋다고 본 것이 틀림이 없다. 찾기만 하면 그 사람을 맨발로 저 눈 위에 세워 놓고 어디 안 뛰나 보자! 하는 심보로 지켜 보고 싶었다. 아니 그러기에는 방울이도 맨발인데 정말 신이나 보이긴 했다. 방울이가 뛰어 지나가는 자리에 막 피어 오르는 목련 봉오리 크기의 발자국이 하얀 꽃 모양으로 피어 올랐다. 나는 달달 떨며 지붕 밑에 눈이 쌓이지 않은 땅을 골라 걸었다. 나이 탓인가? 눈이 와도 설렘도 없고 예쁜지도 모르겠다. 단지 눈이 많이 오면 엄마가 집에 갇혀 외출을 못해 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다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몸을 끼어 간신히 비집고 집안으로 들어 오다 눈이 튀어 나갈 뻔 했다. 짜부라진 얼굴과 몸통을 흔들어 털고 나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오니 얼었던 발바닥이 녹으며 간질간질하다. 에구구~눈 오는 날 뜨뜻한 방바닥에 깔아 놓은 이불 밑으로 기어 들어가 몸을 지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털이 길지 않아 최고로 좋은 점은 평생 애견미용이라는 예쁜 이름 뒤에 숨어 무시무시한 기계와 가위를 든 언니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실체를 알게 된 것은 무더운 여름 오후였다. 방울이 미용하러 가는 날 나도 거기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엄마가 다녀올 곳이 있다며 “오리오, 낑낑대지 말고 얌전히 있어. 말 잘 듣고 알았지?” 언니들은 나 대신 대답을 했다. “네, 걱정 마시고 2시간 후에 돌아 오시면 돼요” 하고 생글생글 웃었다. 언니들의 미소는 살인적으로 친절했다. 그 미소에 마음을 풀어 놓고 한 바퀴 둘러 볼까 하는 찰라 잡혀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엄마에게 받아 아기처럼 안고 있던 방울이를 갑자기 옆구리에 끼더니 “너, 오늘 날도 더운데 지난 번처럼 말 안 들어 땀나게 하면…..화아악!” 하며 귀를 잡아 마구 흔들었다. 완전 돌변하는 언니들은 공포 영화에 가위든 여주인공처럼 무시무시했다. 방울이 꽁지를 하늘 높이 들어 뒷 다리를 땅에 못 닿게 하고는 기선 제압을 했다. 우리 개들은 발이 땅에 안 닿으면 힘을 못쓰는걸 알고 있군. 방울이는 죽는다 발버둥치고 그럴수록 똥꼬를 하늘 높이 땡기며 사정 없이 소리를 질렀다. “가만 있으라고 했지? 야 이 똥개야 너 한번 만 더 움직이면 오늘 개 장수에게 확 팔아 버릴 테야” 조용하다. 방울이의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났나 싶었다. 철퍼덕 싱크대에서 던져졌다. 눈, 코, 귀까지 온통 샴푸 질을 하고는 샤워기로 꽃밭에 물주듯이 머리 위에서부터 솨아아~ 뿌리며 걸레 빨듯 비벼댔다. 엄마가 방울이를 씻길 때는 귀와 눈에 물이 들어 간다고 손에 물을 묻혀 어린 아이 세수 씻기듯 살살 닦아 주었는데…… 방울이의 얼굴은 타이타닉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그리며 물 속으로 가라 앉기 직전의 모습과 같았다. 조금 뒤 방울이를 유태인 학살 가스실 같은 곳에 밀어 넣으려 했다. 방울이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주저 앉아 절대 그곳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세로 버텼다. ‘방울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도망가’ 나는 제자리를 뱅뱅 돌며 앞발을 들고 계속 짖었다. 질세라 언니는 발로 방울이를 밀어 넣고 잽싸게 문을 잠갔다. 결국 힘세고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세상이다. 몸 몇 번만 털면 다 마르는 털을 굳이 저 안에서 30분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인간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아직도 인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다행히 우리 용감한 방울이는 살아 있었다.
2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인 줄 몰랐다. 엄마가 왔다. 엄마는 장을 보고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말았다. 미용 언니는 갑자기 혀가 짧아지고 목소리까지 변했다. 아까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는 어디 가고 “어머니, 우리 방울이 미용 끝났떠용. 우리 방울이 너무 예뻐서 미스코리아대회에 나가도 되겠네 호호 이만 오천 원입니다.” 나는 순간 목덜미 털이 확 일어나더니 구두 솔처럼 빳빳해졌다.
세 계절 이발 안하고 시원하게 살지만 긴 겨울의 추위를 혹독하게 참아야 하는 일은 방울이가 미용을 하는 일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다. 물론 요즘 같이 좋은 세상에 털 코트에 개 신발까지 나온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겠지만, 까칠한 내 성격이 문제이다. 엄마가 춥다고 걱정을 하며 옷을 입혀 놓으면 하루 종일 그 옷이 벗겨 나가질 때까지 몸부림을 쳐서 옷을 벗어 버려야 직성이 풀렸다. 털 옷 위에 내복을 겹쳐 끼여 입은 답답증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평범하지 못 한 성격으로 겨울이면 사서 고생을 한다. 브레이크 댄스를 한 바탕 추고 나면 옷이 뱀허물 벗겨지듯 스르르 벗겨진다. 이때다 싶어 알몸으로 뜨끈한 이불 속을 찾아 쏙 들어간다. 뭐니뭐니해도 한 겨울 뜨끈한 방바닥에 맨몸으로 뼈까지 노글노글하게 지지며 즐기는 낮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여가 생활이다. 단잠에 빠져들 무렵 탱크같이 힘이 센 방울이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듯 이불을 걷어 내고 “오빠 뭐해? 놀자”하며 시꺼먼 큰 얼굴을 들이 댄다. 이크! 또 걸렸다. 방울이는 숨바꼭질 놀이로 나를 찾아내듯 나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불 가장자리는 더 이상 나의 개인적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는 장소였다. 머리를 써야지. 저 녀석의 힘으로 파고 들어 올 수 없는 곳을 찾아라. 나는 두더지 작전을 이용해 이불 깊숙이 파고 들었다. 아~ 이 아늑함과 평화로움, 아무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장소에서 나만의 자유가 필요했다.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듯한 통증과 내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느냐 요동을 친다. 방울이의 레이다망을 피해 이불 속 깊이 숨어 콜콜 자고 있었다. 그러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식구들의 체중이 실린 발에 밟히곤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어김없이 우리 조상인 지옥의 수문장 노릇을 맡고 있다는 케르메르스를 만나고 인사하고 오는 기분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 조상 개는 신이 통치하는 지옥의 수문장 노릇을 맡고 있어 아직까지 대부분의 개들이 집 앞을 지키는 수문장 노릇을 한다고 하니 내가 좋아하는 조상은 아니다. 그래서 얼른 케르메르스가 내 육신을 걷어 들여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이불 속에서 비실비실 기어 나왔다. 난 쥐도 아닌데 털이 쥐처럼 나있어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 나섰다. 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었다. 깜깜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이불 밑과는 또 다른 기분의 따뜻함이었다. 나는 해바라기처럼 해를 쫓아 다녔다.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는 나에게 선물로 들어온 배를 감싸고 있는 하얀 스티로폼 껍데기를 머리에 둘러 끼워주었다. “오리오 너 해바라기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완전 해바라기 모습이었다. 자고 있는 나를 귀찮게 하는 엄마에게 하얀 이를 들어 내고 으르렁 거렸다. 그러자 엄마는 웃으며 ”오리오, 너 완전 사자다” 하며 배를 잡고 웃었다. 따뜻한 햇살 속에 ‘웃음’ 이것이 내가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돌아다니지도 않고 밥 먹는것도 거른 채 글만 쓰고 있어.
눈동자는 게슴츠레 풀리고 털에 윤기를 잃어가고 있어.
오리오 방을 들여다 보니 사람 걸어다녀야 하는 길에
잡동산이 펼쳐 놓은 오일장 같이 발 딛을 틈도 없어 오리오 방에 갈 땐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슥슥 밀며 걸어다니는 거 있지.
나도 속이 터져 야~ 너 방 안치워? 다리 근육이 해파리처럼 되기 전에
산책도 하고 왈왈 짖으며 생기 있게 굴란 말이야 이거 원 재미 없어서 살겠냐구? 하고
소리를 냅다 질르면 더러운 방에서 창조가 탄생 된 다나 뭐라나..... 개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야. ㅎㅎ 지라고 사랑이 없겠어?
오늘은 멋진 로맨스를 쓰라고 저 놈의 목을 졸라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