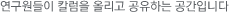
- 써니
- 조회 수 2513
- 댓글 수 6
- 추천 수 0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단 하루 만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시커멓게 타서 검게 그을려 시체가 된 사내의 얼굴을 보았다. 겨우 하루 밤새 오장육부가 속수무책으로 일순간 활활 검은 화기를 몰고 심장까지 타들어가 일그러져버린 영웅의 초췌한 모습이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해일을 일으키며 밀물처럼 뻗쳐오는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그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는 없는 남자의 괴로운 얼굴이었다. 저절로 엎드려 울고 싶어 하고 통곡하는, 그러나 속 시원하게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이 갑자기 모든 것이 딱 멈추어 정지해 버린 아뜩함 외에 달리 아무 생각도 어떤 대안도 찾을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다. 내가 그와 사는 동안 아니 내가 그를 알고 지내는 동안의 가장 정직한 얼굴로 심장도 머리도 멎어버린 사람 같았다.
그는 나를 무심히 바라보며 왜 왔느냐고 건성으로 물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한없는 반가움으로 가득 찼을지 모른다. 되는 대로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가서 간단하게 속을 덥히고 반주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가누기 위해 보이는 가까운 아무데나 가서 일단 쉬어야 할 것 같았다. 침대가 아닌 온돌 장판이 깔린 건물의 맨 갓방이었다. 하얗게 요와 이불보가 씌워져 깔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맥이 풀어진 상태였다. 말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일단 재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도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맥주를 시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로와 포만감과 술기운이 돌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어 했다. 한숨을 몰아쉬며 그가 말했다. 언제나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선이야, 나 천벌 받나봐. 나, 용서해줘. 그리고 잘살아.” 그가 제 입으로 하는 말이었다.
.......
나도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하며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곤하게 잘 수 있도록.
아직 백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미 이혼을 하였지만 그리고 거의 석 달이 다 되었지만 나는 예전에 그와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렇게 죽은 듯,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듯 연명해 있었다.
이혼 후 일주일 쯤 지나 늦은 밤 만취한 그에게 전화가 왔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없었는지 공중전화로 걸려왔고 그가 오래 전화통을 붙들고 있자 뒤에서 술 취한 사내들이 뭐라고 지껄여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전화를 오래 쓴다는 말이었다. 그래도 그는 공중전화를 붙들고 늘어졌다. 끊어지면 또 걸고 끊어지면 또 걸어 한참을 횡설수설 했다. 어디냐고 물었지만 집 앞이라고만 할뿐 끝내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아마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관 어딘가에 쓸어져 잘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일렀다. 누이에게만 맡겨두는 게 싫다고 말했다. 어디로 증발해 있는지 알 수 없는 때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몇 번이고 이름을 부르며 이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나도 울었다. 날이 밝자 이혼까지 했으니까 달라진 줄 알고 한달음에 올라갔다.
그는 마중도 나오지 않았고 나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만들었다. 찾아갔다. 먼저 와서 쉬고 있었다. 어제 밤의 그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초조해 하지 않았다. 짜증부리지도 않았다. 잘못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할 뿐이었다. 이미 골백번 수천 번 겪은 일이었으니까. 여전한 예전의 그가 호텔의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대서나 자는 것을 무지 싫어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밥은 싼 것을 먹어도 비싼 호텔로 잡은 것이었다. 아무런 결론 없이 아니 어디로 거처를 옮길 것인지를 물었고 다음날 우리는 다시 헤어졌다. 나는 울산으로 내려갔다. 그대로 지내다가 얼마 후 그가 내려왔다. 그리고 집으로 오지 않고 시내에서 함께 머물다 올라갔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며 시간이 흘렀다.
내 몰골은 배배 꼬여갔다. 단 한 집 정혁 엄마만 내가 죽었을까 싶어 나를 밥 먹이고 가끔씩 들여다보고는 하는 정도였다. 나는 이혼했노라고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누가 와서 정탐을 하던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혼 전 그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부하 직원을 시켜 내 동태를 파악하고는 했지만 이혼 후 나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지냈다. 이혼 했으니까. 더는 시달릴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먼지처럼 버려진 가구처럼 거의 꼼짝하지 않고 처박혀있었다. 죽을까 말까 이 생각 저 생각 자다 말다 미치다 죽지 못하고 송장으로 그렇게 지냈다.
우연히 신문을 집어 들게 되었다. 그의 회사가 일간지 1면을 큰 글씨로 장식했다. 깜짝 놀랐다. 나는 당장 내려가 공중전화를 걸었다. 걱정이 돼서 걸었는데 그가 그 사무실의 온 직원이 다 듣도록 우리의 이혼을 외쳐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부렸다. 이혼했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괘씸하기도 하고 치욕스러웠으나 꾹 참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알았다고 하고 즉시 서울로 올라가 그를 만났다.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 청춘을 받쳐 한 곳에서 꾸준히 지켜온 회사에 일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와의 이혼은 한낱 게임에 지나지 않았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다. 오직 의기양양했고 자신에 넘쳐있었던 것이다. 그는 단 하루 사이에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거들먹거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몰랐던 것이다. 중역 몇 몇을 제외하고는 설마 그렇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배신감’이라는 말에 하마터면 웃음이 튀어나올 뻔 했다. 그토록 중요한 때에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딴엔 이리저리 뛰며 살았을 것이다. 남자답기 위하여 휴대폰도 꺼놓고 어울려 퍼마시며 의리를 지킨답시고 가정을 등한시하길 예사로 했었다. 호탕함을 빙자하며 영웅 심리에 들떠서 하룻밤 여자를 취하듯 아내도 가볍게 함부로 버렸던 것이리라. 그토록 믿으며 자신과 같다고 생각한 동지들은 그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었을까? 그가 자기들 세계를 지키며 나를 소외시켰듯이 그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
보도 직전에야 겨우 알았다는 그가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을 지가 궁금하다. 나는 다만 한 가지를 알 뿐이다.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때에도 누이가 아이들보다 먼저였을까?
무엇을 용서하라고 하며 잠들었던 것일까? 진담은 아니었다. 진담이었으면 또 다시 헤어지지 않았다. 그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 무엇인가? 나는 그가 한 번도 자기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는 늘 어머니를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움직이는 것은 누이였다.
IP *.36.210.80
그는 나를 무심히 바라보며 왜 왔느냐고 건성으로 물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한없는 반가움으로 가득 찼을지 모른다. 되는 대로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가서 간단하게 속을 덥히고 반주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가누기 위해 보이는 가까운 아무데나 가서 일단 쉬어야 할 것 같았다. 침대가 아닌 온돌 장판이 깔린 건물의 맨 갓방이었다. 하얗게 요와 이불보가 씌워져 깔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맥이 풀어진 상태였다. 말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일단 재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도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맥주를 시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로와 포만감과 술기운이 돌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어 했다. 한숨을 몰아쉬며 그가 말했다. 언제나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선이야, 나 천벌 받나봐. 나, 용서해줘. 그리고 잘살아.” 그가 제 입으로 하는 말이었다.
.......
나도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하며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곤하게 잘 수 있도록.
아직 백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미 이혼을 하였지만 그리고 거의 석 달이 다 되었지만 나는 예전에 그와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렇게 죽은 듯,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듯 연명해 있었다.
이혼 후 일주일 쯤 지나 늦은 밤 만취한 그에게 전화가 왔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없었는지 공중전화로 걸려왔고 그가 오래 전화통을 붙들고 있자 뒤에서 술 취한 사내들이 뭐라고 지껄여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전화를 오래 쓴다는 말이었다. 그래도 그는 공중전화를 붙들고 늘어졌다. 끊어지면 또 걸고 끊어지면 또 걸어 한참을 횡설수설 했다. 어디냐고 물었지만 집 앞이라고만 할뿐 끝내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아마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관 어딘가에 쓸어져 잘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일렀다. 누이에게만 맡겨두는 게 싫다고 말했다. 어디로 증발해 있는지 알 수 없는 때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몇 번이고 이름을 부르며 이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나도 울었다. 날이 밝자 이혼까지 했으니까 달라진 줄 알고 한달음에 올라갔다.
그는 마중도 나오지 않았고 나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만들었다. 찾아갔다. 먼저 와서 쉬고 있었다. 어제 밤의 그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초조해 하지 않았다. 짜증부리지도 않았다. 잘못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할 뿐이었다. 이미 골백번 수천 번 겪은 일이었으니까. 여전한 예전의 그가 호텔의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대서나 자는 것을 무지 싫어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밥은 싼 것을 먹어도 비싼 호텔로 잡은 것이었다. 아무런 결론 없이 아니 어디로 거처를 옮길 것인지를 물었고 다음날 우리는 다시 헤어졌다. 나는 울산으로 내려갔다. 그대로 지내다가 얼마 후 그가 내려왔다. 그리고 집으로 오지 않고 시내에서 함께 머물다 올라갔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며 시간이 흘렀다.
내 몰골은 배배 꼬여갔다. 단 한 집 정혁 엄마만 내가 죽었을까 싶어 나를 밥 먹이고 가끔씩 들여다보고는 하는 정도였다. 나는 이혼했노라고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누가 와서 정탐을 하던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혼 전 그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부하 직원을 시켜 내 동태를 파악하고는 했지만 이혼 후 나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지냈다. 이혼 했으니까. 더는 시달릴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먼지처럼 버려진 가구처럼 거의 꼼짝하지 않고 처박혀있었다. 죽을까 말까 이 생각 저 생각 자다 말다 미치다 죽지 못하고 송장으로 그렇게 지냈다.
우연히 신문을 집어 들게 되었다. 그의 회사가 일간지 1면을 큰 글씨로 장식했다. 깜짝 놀랐다. 나는 당장 내려가 공중전화를 걸었다. 걱정이 돼서 걸었는데 그가 그 사무실의 온 직원이 다 듣도록 우리의 이혼을 외쳐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부렸다. 이혼했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괘씸하기도 하고 치욕스러웠으나 꾹 참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알았다고 하고 즉시 서울로 올라가 그를 만났다.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 청춘을 받쳐 한 곳에서 꾸준히 지켜온 회사에 일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와의 이혼은 한낱 게임에 지나지 않았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다. 오직 의기양양했고 자신에 넘쳐있었던 것이다. 그는 단 하루 사이에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거들먹거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몰랐던 것이다. 중역 몇 몇을 제외하고는 설마 그렇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배신감’이라는 말에 하마터면 웃음이 튀어나올 뻔 했다. 그토록 중요한 때에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딴엔 이리저리 뛰며 살았을 것이다. 남자답기 위하여 휴대폰도 꺼놓고 어울려 퍼마시며 의리를 지킨답시고 가정을 등한시하길 예사로 했었다. 호탕함을 빙자하며 영웅 심리에 들떠서 하룻밤 여자를 취하듯 아내도 가볍게 함부로 버렸던 것이리라. 그토록 믿으며 자신과 같다고 생각한 동지들은 그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었을까? 그가 자기들 세계를 지키며 나를 소외시켰듯이 그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
보도 직전에야 겨우 알았다는 그가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을 지가 궁금하다. 나는 다만 한 가지를 알 뿐이다.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때에도 누이가 아이들보다 먼저였을까?
무엇을 용서하라고 하며 잠들었던 것일까? 진담은 아니었다. 진담이었으면 또 다시 헤어지지 않았다. 그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 무엇인가? 나는 그가 한 번도 자기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는 늘 어머니를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움직이는 것은 누이였다.
댓글
6 건
댓글 닫기
댓글 보기
VR Left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92 | [74] 바람은 색깔로도 불어온다 | 써니 | 2008.03.23 | 2474 |
| 591 | [73] 이혼이라는 주홍글씨 | 써니 | 2008.03.23 | 2690 |
| 590 | [72] 굿 | 써니 | 2008.03.22 | 2429 |
| 589 | [칼럼47]마지막 출근 [6] | 素田 최영훈 | 2008.03.21 | 2619 |
| 588 | (44) 도가 트는 생각법 [10] | 香仁 이은남 | 2008.03.21 | 2793 |
| » | [71] 그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6] | 써니 | 2008.03.20 | 2513 |
| 586 | [70] 조강지처야, 조강지첩할래? | 써니 | 2008.03.18 | 2925 |
| 585 | [69] 담배꽁초와 연탄 | 써니 | 2008.03.17 | 2967 |
| 584 | [68] 식수와 불자동차 | 써니 | 2008.03.16 | 2278 |
| 583 | (43) 까칠녀? [3] | 香仁 이은남 | 2008.03.16 | 2858 |
| 582 | (42) 시원 섭섭 [3] | 香仁 이은남 | 2008.03.16 | 2553 |
| 581 | [67] 엎어진 세숫대야와 맹모삼천지교 | 써니 | 2008.03.16 | 2755 |
| 580 | [66] 후련히 살다가 홀연히 갈 수 있는가? [2] | 써니 | 2008.03.15 | 2632 |
| 579 | [65] 벗으로부터 배운다 | 써니 | 2008.03.14 | 2515 |
| 578 | [46] Pre-Book Fair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1] | 교정 한정화 | 2008.03.13 | 2547 |
| 577 | [64] ‘붓꽃’과 ‘이별’ | 써니 | 2008.03.13 | 2247 |
| 576 | [63]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2] | 써니 | 2008.03.12 | 3131 |
| 575 | [62] 옥이 | 써니 | 2008.03.12 | 2567 |
| 574 | [61] 性愛는 어떻게 친밀해 지는가 | 써니 | 2008.03.12 | 2268 |
| 573 | [60] 文明王后? 문희文姬 | 써니 | 2008.03.11 | 3874 |












